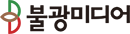낯설었다. 서울에서 멀리 있는 부산은 숱하게 찾으며 머무르곤 해서 익숙했지만, 정작 부산보다 가까운 대구에는 이틀 이상을 머물러 본 기억이 없었기 때문이다. 낯선 대구에 들러 먼저 간 곳이 팔공산이다. 초행이었다. 접근이 쉬운 하늘 정원에 올라 팔공산 산세를 어림잡았고, 낯선 이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아니 그들이 먼저 나에게 인사를 건넸다. “좋은 사진 많이 찍었능교?”라는 인사를 한 시간에 한 번꼴로 들었다. 가산바위에서 만난 한 무리의 보살님들은 “우리 사진 좀 찍어주소. 역시 작가님이네, 억수로 잘 나왔네”라며 말을 건넸다. 파계사로 왔다. 주지 스님은 “한 달이라도 좋아요. 마음 편하게 들고 나면서 편하게 머무르세요”라며 예전 당신이 쓰던 방을 내주었다. 팔공산 만행은 이렇게 시작됐다.


열 분의 스님이 동안거 결제 중인 성전암에 들러 현응선원장 벽담 스님을 만났다. 스님은 2007년 성전암 화재 뒤부터 머물며 지금과 같은 도량을 일궈왔다. 그동안 한 번도 자리를 비운 적 없이 목탁을 치며 탁발했다. 말이 느리고 목소리가 작아 기도와는 거리가 먼 수좌 스님이라 생각했었는데, 사시 예불 때 관음전에서 들려오는 염불 소리는 큰 절에서 기도하는 스님 못지않게 구성지고 우렁차다. 풍수로 그 좋다는 닭이 알을 품는 형국의 성전암이라지만 한편으로 관음도량인 것도 같다고 귀띔한다. 사시 예불 때 관음전에는 예를 올리는 보살님들이 빼곡하다. ‘몸 받았을 때 공부해야 한다’고 하는 스님의 말이 진하게 울린다.


대비암 동쪽 기슭에 있는 영조 대왕과 인연이 깊은 현응대사의 승탑을 만났다. 현재의 파계사 터는 현응대사에서 비롯한다. 4기 중 오직 1기의 승탑만이 현응대사의 것으로 생각했던 예상을 주지 스님이 바로 잡아줬다. 그동안 변변한 해석이 없었던 것을 스님이 얼마 전 전문가에게 의뢰해 해석을 얻었다는 것이다. “선사의 휘는 영원이며 어려서 출가했다. 스무 살에 눈에서 사리가 나왔으나 분실했고, 세수 육십에 원적에 들어 사리 3좌를 수습해 승탑 3기에 안치했다. 또 1좌는 일찍이 스님이 출가 백일이 되는 때에 백의관음보살에게 천도재를 지낼 때 얻은 것이다”가 비 뒷면의 내용이다.


원통전에서 조선 21대 왕이 되기 전의 연잉군을 만났다. 파계사는 현응대사와 영조의 인연으로 왕실 원당이 됐고, 그 내용이 고스란히 원통전에 담겼다. 후불탱인 <영산회상도>에는 연잉군을 비롯한 왕실 사람들이 발원자로 기록돼 있다. 그림이 그려진 1706년은 1701년 장희빈이 죽고 난 뒤 왕위 계승 문제로 혼란한 시기였다. 어쩌면 대군을 세상에 나게 했던 인연이 또 한 번 힘을 발휘해 대군을 세상에 우뚝 서게 하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이런 때를 대비해 왕실이 원당을 후원하며 지켜주는 것일 테니까. 파계사 수미단의 2단에 새들이 있는 게 육지 동물이 있는 백흥암 극락전 수미단과 차이다.



원통전 기도 소임을 보는 법경 스님을 도량석 중 만났다. 열흘 가까이 머무는 동안 스님의 모습은 한결같았다. 도량석을 돌기 전 각 전각에 등을 밝힌 뒤 원통전에 앉았다. 네 시 정각에 부처님 전에 도량석을 고하고 원통전 전각을 돌았다. 원통전 서편에 있는 기영각 앞에서는 약 30초쯤 멈춰서 독송했고, 원통전 뒤를 돌아 동쪽 미타전 큰길까지 나가 또 몇 초간 독송했다. 다시 원통전을 한 바퀴 돈 다음 부처님 전에 예를 올리고 마무리한 뒤 곧장 원통전 안으로 들어 금고를 두드리며 종송을 했다. 큰 절이 아니라서 도량석과 종송 시간을 그 절반으로 한다고 했다. 하루 한 번으로 끝날 것으로 알고 촬영을 허락했던 스님은 며칠간 이어지는 촬영에 “처음 내가 허락했으니 어쩔 수 없죠”라며 덤덤히 받아들였다.


파계사 주지 허주 스님과 상좌 청허 스님을 만났다. 두 스님의 관계는 내가 지금껏 보아 온 은사 상좌 사이 가운데 가장 독특했다. 한마디로 허물이 없었다. 그렇다고 상좌 청허 스님이 예의 없이 은사 스님을 대한다는 것은 아니고, 순간순간 나고 드는 타이밍이 절묘하다는 것이다. 덩달아 함께 있는 삼자도 첫 만남부터 자연스러운 관계에 든다. 어쩌면 두 스님이 낯선 이에게 전하는 최고의 배려일지도 모른다. 최근 파계사에서는 많은 불자와 함께하는 보름 포살법회를 열었다. 어지간한 큰 절의 초하루 법회보다 많은 불자가 참석했다. 수능기도 100일 회향 법회에는 전각 밖으로까지 동참자들이 자리했다. 학생 대표가 “요행도 바라지 않습니다”라는 발원을 할 때, 순간 한 어머니가 울먹였다.







많은 사람을 만났다. 이른 새벽 앞산에 오를 때는 팔공산과는 다르게 20~40대의 젊은이들이 대부분이었다. 앞산은 마치 피라미드의 벽처럼 가팔라서 오르기가 여간 힘겨운 게 아니었음에도, 그들은 늘 걷는 것처럼 꾸준하게 올랐다. 하나같이 건장했고 에너지가 강한 몸이었다. 숨 가쁜 길 중간에 묻는 말에도 친절하게 답했다. 팔공산에서 앞산까지 이번 대구에는 줄곧 사람들이었다. 파계사를 어떻게 담을지 애를 쓰던 중 불현듯 팔공산 영역에서 만난 이들의 모습이 떠올랐고, 이들이 다시 파계사 마당과 전각 곳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그들이 카메라를 대는 그곳에 파계사와 나의 팔공산이 있었다. 팔공산 만행을 이렇게 마쳤다. 파계사 주지 스님과 여러 대중 스님들, 종무원과 후원 보살님들 그리고 다음 카페 ‘옛님의 숨결’ 운영자로서 이번 취재에 많은 도움을 준 선과 선생님에게도 깊은 감사를 전한다. 많은 분의 도움에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지 못한 데는 나의 게으름을 탓할 수밖에 없다.
글・사진. 유동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