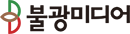사방에 빗장을 걸어라 도를 이루기 전에는 나갈 수 없다
내륙에 자리한 구례와 곡성까지도 꽤 많은 눈이 쌓이고 있었으나, 눈구름이 화개에 다다라서는 산등성이에서 맴돌 뿐 땅에 닿을 때쯤에는 진눈깨비가 되어 추적거렸다. 지리산 남쪽에 자리한 쌍계사는 평온하고 아늑하다. 쌍계사 뒤로는 주산인 지리산이, 앞으로는 안산인 백운산이 쌍계사를 감싸고 있다. 모두 1,000m가 넘는 큰 산인 데다 지리산 자락의 남쪽 계곡에 자리하다 보니 쌍계사 스님들은 쌍계사를 지리산의 주인으로 본다. 보조국사 지눌, 서산, 부휴, 벽암, 성총 스님 등 조계종의 선맥을 잇는 역대 큰 스님들이 쌍계사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셨으니 그럴 만도 하다. 도성암과 사관원은 큰 절에서 겨우 20여 분 거리에 있으나, 쌍계사에서는 굳이 산내 암자로 내놓고 말하지 않는다. 아마 선방 스님들의 수행처로 보호하려는 의도 때문일 것이다. 사관원은 옛 기록에는 옥소암으로 불렸다. 건립 시기는 조선 시대 지리산을 다녀가며 유람기를 남긴 조위안의 글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담양의 선비 이성국이 수행차 들어와 20년을 공부하다 사재를 털어 건립’한 것으로 나온다. 이번 철에는 해인사 수좌 승연 스님이 유구한 지리산 선맥에 좌복을 틀었다.
월간불광 과월호는 로그인 후 전체(2021년 이후 특집기사 제외)열람 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불광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