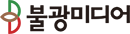사고(史庫), 역사를 보관하다
조선시대 기록문화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왕조실록』이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됐다. 실록으로 대표되는 왕조의 통치 기록, 고려·조선시대의 역사 기록, 국가적으로 중요한 서적과 문서는 이를 보관하던 창고인 사고(史庫, 사각史閣, 실록고實錄庫, 지고地庫)에 보관돼 엄격하게 관리됐다. 사고에는 『조선왕조실록』과 『선원록』과 같은 조선 왕실의 계보, 중요한 역사서, 경학서 등이 함께 보관됐다. 이처럼 사고는 서적보관소로서 의미가 깊은 곳이었다.
조선은 “역사는 천하의 시비를 공정하게 하여 만세의 권계(勸戒, 훈계)를 남기는 것”이라는 목적으로 초기부터 실록을 편찬했다. 이를 효율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한 곳에만 보관하지 않고 나누어 관리하는 사적분장지책(史籍分贓之策), 즉 사마천이 이야기한 “(정본은) 명산에 간직하고 부본(副本)은 서울에 둔다”라는 형식으로 관리했다. 결과적으로 전란의 참변에서 실록을 지켜낼 수 있었다.
고려 전기에는 실록을 편찬해 개경의 사관(史館), 즉 춘추관에만 사고를 설치했다. 하지만 고려 현종 때 거란의 2차 침입으로 모두 소실됐다. 이후 태조~목종까지의 7대 실록을 다시 편찬했고, 이마저 1126년(인종 4) 이자겸의 난으로 궁궐이 불탈 때 위험에 처해졌으나 숙직 중이던 김수자(金守雌)의 노력으로 보존됐다. 1227년(고종 14) 처음으로 해인사에 외사고(外史庫, 서울 밖의 사고)를 설치했다. 고려 공양왕 대에는 외사고가 충주 개천사(開天寺)에 있었다.
조선 개국 당시 내사고(內史庫, 서울 안에 설치한 사고)는 춘추관, 외사고는 충주에 있었다. 1445년(세종 27) 경상도 성주와 전라도 전주에 외사고를 추가, 4대 사고(四大史庫) 체제를 갖췄다. 외사고를 성주에 설치한 까닭은 해인사와 가깝다는 것, 전주는 이성계의 선조가 살았던 발상지이자 왕의 초상인 어진(御眞)이 봉안된 곳이라는 이유였다.
사고의 관리는 엄격하여 1538년(중종 33) 성주사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성주목사 등 담당 관리들에게 책임을 물어 파면시켰다. 불타버린 성주사고는 재건됐다. 조선 전기에는 성주사고 화재 외 큰 사건 없이 원만하게 관리됐다. 사고 관리는 춘추관에서, 대한제국 시기인 1898년(광무 2)부터 의정부가 10여 년 정도 주관했다. 한일합병 이후에는 일제가 관리했다. 사고의 문을 여는 일은 엄히 실시됐다. 실록을 새로운 사고에 봉안하거나 정기적으로 포쇄(曝曬, 책을 말리는 것)할 때, 실록을 옮겨 봉안할 때, 전례(前例)를 참고할 때 등 외에는 열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외사고는 원칙적으로 전임 사관(史官)인 한림(翰林) 8원 중 한 사람이 배석해야만 열 수 있었다. 부득이한 경우는 겸임 사관이 파견됐다. 이 원칙은 조선시대 전 기간에 걸쳐 지켜졌다.
실록의 포쇄를 지방 도사나 수령이 사관을 겸임하는 외사(外史)가 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허용되지 않았다. 예외적 경우도 있었다. 임진왜란 시 전주사고의 외사 이순민(李舜民) 등이 실록을 내장산으로 급히 옮겼고, 이로써 사고를 지키게 됐다.
조선 전기 사고의 관리에 대한 사목 등이 전해지지 않아 어떻게 사고를 관리했는지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충주사고의 경우, 수호관 5원, 별색호장(別色戶長)・기관(記官)・고직(庫直) 각 1원 등이 있었다고 한다. 임무는 주로 화재나 누수, 그리고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임진왜란 당시 춘추관·성주·충주사고가 일본군에 의해 방화된 것은 전란의 급박성도 주요한 원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네 곳에 사고를 설치해 수호관 배치를 소홀히 하는 등 방심했던 것도 그 이유 중 하나로 보인다.
사찰에 사고를 세우다
조선 전기에는 성주사고 외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사고 관리에 커다란 전환점을 맞게 된다. 공교롭게도 전주사고를 제외한 세 곳이 일본군의 북상로(北上路)에 있었다. 임진왜란 이전에 양성지(梁誠之, 1415~1482)는 외사고가 교통 행정상의 중심지인 도회지에 위치해 “화재와 외적의 침입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전란 중 춘추관·충주·성주 세 곳의 사고가 불타버렸다. 담당 관리와 민간인의 발 빠른 대처로 전주사고만이 미리 내장산의 깊숙한 암자로 옮겨 보존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새로운 사고 지정에 참작됐다. 조선은 임진왜란 이후 막대한 비용과 인력을 동원해 실록을 복인(復印)했다. 조선왕조는 사고를 인적이 드문 깊은 산속에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새로 선정된 외사고는 마니산, 묘향산, 태백산, 오대산 등 4곳이었다. 내사고인 춘추관을 포함하여 5개 사고체제로 확대했다.
이곳들은 조선 전기 4대 사고와 인연이 있던 지역이었다. 묘향산은 임진왜란 중에 실록을 잠시 보관했고, 강화도 마니산 역시 고려시대와 임진왜란 때 실록을 보관한 지역이었다. 태백산은 해인사와 성주사고의 맥을, 오대산사고도 충주사고의 맥을 잇는 지역이었다.
강화도 마니산사고는 병자호란과 1653년(효종 4)의 화재로 1660년(현종 1) 정족산에 새로 사고를 마련했다. 이곳은 산성으로 둘러싸여 있는 데다가 전등사가 있어 사고를 지키기 좋은 여건이었다. 묘향산사고는 후금(後金, 후의 청나라)이 위협하자 1618년(광해군 10) 적상산(赤裳山)에 사고를 건립했고, 1633년(인조 11) 모두 옮겼다.
결국 춘추관사고본은 ‘이괄의 난’과 순조 대 화재로 실록의 잔본만 남았다. 오대산사고본은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강제로 유출된 뒤 관동대지진 때 소실돼 일부만 남아 있다. 정족산사고본은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태백산사고본은 국가기록원 부산지소에, 적상산사고본은 북한의 평양에 보존돼 있다.


임진왜란 후 외사고가 깊은 산속에 위치하면서 사고 관리를 위해 사찰을 활용했다. 조선왕조의 숭유배불정책에 어긋났으나, 사고가 산속에 있는 여건상 사찰의 활용과 수비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도 있었다.
정족산사고는 전등사(傳燈寺), 적상산사고는 안국사(安國寺), 태백산사고는 각화사(覺華寺), 오대산사고는 월정사(月精寺)가 사고 수비를 담당했다. 예조에서 사찰의 주지를 수호총섭(守護總攝)으로 임명하고, 사고 수비를 위해 승려들을 모집했다. 도망가는 경우는 지방관청에서 수비군을 별도로 배치했다.
『적성지(赤城誌)』에 의하면, 고종 대 적상산사고를 지키는 인원수는 “총섭 1명(안국사 주지), 대장(代將) 1명, 화상(和尙) 1명, 승군 24명, 별장(別將) 1명, 수호군 131명(매월 11명씩 교대), 사부(射夫) 24명(매월 1명씩 교대), 감관(監官) 1명, 별파군(別破軍) 49명(매월 12명씩 교대)”이라고 했다. 매일 54명이 사고를 지켰다. 각 사고에 동일한 인원이 배치된 것은 아니며, 사고에 따라 증감이 있었다. 고종 대 정족산사고는 승군 50명, 오대산사고는 수호군 50명과 승군 20명이 있었다.
사고를 관리하는 관원으로 사고를 총괄하는 참봉 2명이 있었다. 참봉은 대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유학(幼學)으로 임명하는데, 태백산사고의 김용호(金龍浩, 1802~1881)와 김상락(金相洛, 1840~1905) 부자같이 세습하기도 했다.
조선 후기 외사고 관리의 주안점은 습기로 인한 서적의 손상을 막는 데 운영의 초점이 맞춰졌다. 첫째, 소장 서적에 대한 관리로, 중앙에서 정기적으로 사관을 파견해 서적을 포쇄하는 것과 책궤(冊櫃) 안에 천궁·창포 가루 등의 방습제를 넣어 습기를 제거하는 것 등이다. 둘째, 서적을 보관한 사고 건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었다. 참봉과 수직승도(守直僧徒, 사고를 지키는 스님들), 수호군 등이 담당했다. 이들 중에서 관리 책임은 수령의 지휘를 받는 참봉에게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은 수직승도였다.


사고를 지키는 수직승도(守直僧徒)
사고를 지키고 관리하는 데는 많은 인원이 필요했고, 이를 충당하기 위한 경비도 꽤 많이 수반됐다. 이를 어떻게 충당했을까?
사고에 소요되는 경비에 관한 규정은 1606년(선조 39) 제정됐다. 그 내용은 1911년에 조선총독부에서 전국의 사찰 자료들을 모아 편찬한 『조선사찰자료(朝鮮寺刹資料)』에서 알 수 있다. 이 책의 강원도편 「사고절목(史庫節目)」에 1606년 제정된 외사고 관련 규정이 「경외사고수직절목(京外史庫守直節目)」이라는 이름으로 실려 있다. 그리고 『승정원일기』와 『계제사등록(稽制司謄錄(규12975))』 등에서도 단편적으로 규정들을 찾아볼 수 있다. 그 내용은 외사고로 이관하기 전까지 서울에서 실록 등의 서적을 관리하기 위한 지침과 외사고의 수호군, 수직승도, 참봉의 선발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됐다.
사고 관리를 위해 첫째, 행정관리인 참봉에게는 관료(官料, 돈)를 지급하고, 해당 사찰에는 인근의 군현에서 논밭을 주어서 그 전조(田租, 세금)로 경비를 충당하게 했다. 이러한 토지를 위전(位田, 토지)이라 한다.
추가로 국가에서 사고를 관리하는 사찰에 공명첩(空名帖, 이름이 비어 있는 임명장)을 내려보내 경비를 조달하기도 했다. 1864년(고종 1) 안국사와 각화사 수리 경비를 위해 공명첩을, 1880년(고종 17) 각화사가 화재로 소실되자 재건을 위해 공명첩을 다시 발행했다.
둘째, 수직승도를 정하고, 그중 한 명을 수승(首僧)으로 삼아 승도들을 통솔하게 했다. 수직승도들은 사고 수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신역(身役)을 면제하고 다른 잡역을 일체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계제사등록』에서 수직승도에 임명된 승려는 ‘영정수직(永定守直, 수직승도로 정해지면 그 임무만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것)’하는 원칙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영정(永定)’을 강조한 것은 승려들이 사고를 지키는 임무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오대산사고의 수직승도의 경우 강릉과 양양 두 읍에서 승려 40명을 선발해 20명씩 교대로 근무하게 했다. 1686년 강릉과 양양에서 각 30명씩 총 60명으로 늘어났으며, 결원이 생기면 반드시 다른 승려를 대신 정하고(代定僧), 승도 명부를 매년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원칙 준수를 강화했다. 이 규정은 강화사고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 외사고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 원칙이었다. 이에 따라 조선 정부는 「경외사고수직절목」을 바탕으로 각 사고의 상황에 맞게 절목을 다시 상정했다.
선조 대 외사고의 관리를 위해 수직승도를 선발한 것은 기본적으로 사고가 산중에 설치돼 관아에서의 관리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다른 한편으로 임진왜란 당시 승군(僧軍) 활동으로 불교의 위상이 제고되고, 장기간의 전란으로 인한 막대한 인적·경제적 피해 때문에 사고를 관리하는 인력의 차출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이다. 승려들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최적의 노동력이었다.
수직승도들의 임무는 첫째, 가장 본연적인 임무인 사고 건물을 안전하게 지키고 관리하는 ‘수직(守直)’이다. 상시적인 순찰을 통해 건물의 손상 여부를 살피고, 이상이 발견되면 신속히 보고해 수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도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었다.
둘째, 수직 담당자 중 수직승도의 인원은 수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포쇄나 건물 수리 등을 위해 서적을 옮겨야 할 때 이를 운반하는 임무를 수행했을 가능성이 높다. 위급한 일이 발생할 때, 수직승도들은 수호군의 지휘에 따라 사고의 서적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사고 운영의 실제 모습
외사고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수직승도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갖췄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발생했다.
첫째, 대가로 지급하는 토지나 노비 지급과 같은 수직승도 운영 재원의 조달이 원활하지 못했다. 1638년(인조 16) 기사(記事)에 “태백산사고에 2결(結)의 사위전(寺位田)을 지급하도록 했다”는 기록이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1675년(숙종 1) 기사에는 오대산사고에 사위전이 1석락지(石落只)였다고 하지만, 지급된 위전은 10두락지(斗落只)에도 미치지 못했다. 양양의 사찰에 지급되는 노비도 정해진 수(5명)를 채우지 못했다. 태백산사고와 오대산사고의 수직승도 운영에 재정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태백산사고의 경비를 담당한 경북 봉화 같은 작은 마을의 경우 사고 운영 경비 부담이 가중되자 다른 지역으로 옮겨줄 것을 요구할 정도였다. 이러한 상황들은 외사고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조선 정부는 정해진 규정의 준수를 통해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했지만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다.
둘째, 수직승도에 대한 다른 역의 부과를 금지하는 조치가 잘 지켜지지 못했다. 오대산사고 수직승도는 1624~1626년의 남한산성 축성과 평양성 성역(城役)에, 1717년(숙종 43)에는 오대산사고 수직승도로 차정된 양양의 승려들이 북한산성 수비에 동원됐다. 1638년(인조 16)에 남한산성을 수축할 때 적상산사고 수직승도인 각화사의 승려들이 공역에 차출됐다. 이는 수직승도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도망을 초래해 결국에는 사고 수직의 허술로 이어졌다.
셋째, 태백산사고나 적상산사고의 수직승도가 각각 봉화(각화사)와 무주(안국사)에서만 담당했던 것과는 달리, 오대산사고의 경우 강릉 승려만으로 수직 인원을 충당하기 어려워 양양의 승려들을 차정했다. 그런데 먼 곳인 양양 승려들로서는 고역(苦役)이 아닐 수 없었다. 이로 인한 갈등은 지속됐다.
조선 후기 사고를 관리하는 막중한 임무는 산속으로 옮겨지면서 사찰이 그 기능을 담당했다. 그 역할을 수직 승려들이 담당했고, 수직승도는 사고 관리에 중추적 역할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박대길, 「조선시대 사고관리의 변화」, 『국학연구』 14, 2009
이성무, 『조선왕조실록 어떤 책인가』, 동방미디어, 1999
강문식, 「조선후기 오대산사고의 守直僧徒 운영」, 『동국사학』 57, 2014
사진. 유동영
장희흥
대구대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