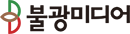추사는 50대 무렵부터 벼슬에 뜻을 접고 ‘병거사(病居士)’를 자처했다. 병거사는 중생의 병이 치유되지 않는 한 자신도 병을 앓을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자신을 찾아온 여러 보살에게 불이법문(不二法門)의 묘경을 보여준 유마거사다. 유마거사는 병을 방편으로 문수보살을 비롯한 성문(聲聞)과 보살들에게 신통을 보여 불가사의한 해탈상(解脫象)을 나타내고, 무주(無住)의 근본으로부터 일체법이 성립됨과 삼라만상을 들어 불이법문을 보였다. 추사는 자신도 중생의 병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에 대한 인식에서 한 차원 더 나아가 자신의 병을 방편으로 당시 시서화단과 불교계에 무언가 계도와 교화를 하고자 했던 뜻이 잠재된 것으로 생각된다.
시·서·화·선리일경론
『유마경』은 뛰어난 문학성을 띠고 있다. 추사가 거론한 모범적인 시인들은 진의 도연명, 당의 왕유·두보·백거이, 송의 소식·황정견·육유, 금의 원호문과 원의 우집, 명의 왕사정과 주이존이다. 나머지는 모두 한 가지 일이 못 되고 방문의 산성과 다름없다고 한다. 왕유는 시문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조차도 ‘마힐(摩詰)’이라고 하였으며, 백거이는 ‘불이법문’ 등 『유마경』을 반영한 시제를 정할 뿐만 아니라 시문 속에서 직접 유마힐을 자칭하기도 했다.
추사의 시·서·화·선리일경론은 일정 정도 『유마경』과 관련지어 이야기할 수 있다. 추사는 시·서·화·선리일경의 전제 아래 서예의 경지를 사공도(司空圖)의 「이십사시품(二十四詩品)」과 같은 선상에서 대비하기도 하고, 『유마경』의 불이법문 논지를 사용하여 달마의 선은 올바른 선이 아니라고 하면서 서예의 임모본(臨摹本)과 대비하기도 한다. 또 그림과 선리(禪理)가 상통한다고 하면서 이런 사실을 왕유의 시와 그림에서 찾는다. 그리고 시·화·선의 일여 경지에서 노닌 사람들은 노릉가(盧楞伽)·거연(巨然)·관휴(貫休) 같은 스님들이라고 한다.
불가에서는 각고의 수행을 거쳐야만 삼매의 경지를 얻고 신통함에 이른다고 한다. 이후 삼매는 가장 진체(眞諦, 변치 않는 진리), 비결 혹은 요령으로 전이되었다. “길이 끊기려다 끊기지 아니하고 물은 흐르려다 흐르지 않는 것”이 “선지의 오묘함”이라고 한다. 이런 표현은 고도의 예술적 차원 또는 수식이나 가공의 흔적이 없는 선리의 오묘함에서나 엿볼 수 있는 경지이다. 추사는 이러한 시경이 객관세계의 외경과 주관세계의 자아가 한데 어우러진 경지라고 한다. 그럼으로써 시리(詩理)·화리(畵理)·선리(禪理)가 한데 어우러져 손가락을 튕기는 사이에 불국토가 화현하고 해인(海印, 부처의 지혜로 모든 만물을 깨달아 아는 일)의 그림자가 나타난다고 한다. 『유마경』 「불국품」에서는 “모든 중생이 사는 곳이 그대로 보살의 불국토”라고 한다. 이 말은 곧 시인이나 화가가 성취해야 할 세계라는 말이다. 불국토라는 개념을 진체로 말하면 다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속체(俗諦, 세간 일반에서 인정하는 도리)로 말하면 어림도 없다. 그러므로 화가나 시인이 진체를 깨닫고 시나 그림에까지 진실한 그 모습을 가지고 오기 전까지는 화가나 시인이 있는 세계는 불국토가 아니다. 불국토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시인이나 화가의 일터이다. 따라서 모든 화가나 시인들이 건설해야 할 정토-시나 그림의 경지-라는 말이다.
시·서·화·선리일경의 체현
『유마경』의 중심은 「입불이법문품」에 있으며, 이 「입불이법문품」의 불이사상은 『유마경』 전체를 일관하는 핵심이다. 불이법문은 그 불가사의한 해탈의 경지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깨달음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입불이법문품」에서 유마가 불이(不二)라고 한 것은 상대적인 차별과 편견을 넘어선 절대 무차별을 말한다. 즉 대립을 떠난 불이의 평등이다. 일체 차별을 떠난 절대 평등을 나타내고 있어서 진여(眞如)·법성(法性)·법신(法身) 등 있는 그대로의 진실한 모습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추사는 시경(詩境, 시의 경지)과 선리의 일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체의 자유로운 의지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나귀를 타고도 나귀인 줄을 모르는 것”, “자기가 나귀를 타고 있음을 알고 있는 것” 두 가지 모두를 비판한다. 모두 다 부처에 얽매여 주체의 자유로운 의지를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사는 이치를 알면서도 끌려다니는 게 세상에서 제일 고치기 어려운 병이라면서 이치를 모르고 끌려다니는 것보다 더 호되게 질타한다. 이러한 주체의 절대적인 자유의지가 바로 추사가 추구한 예술정신이다. 그래서 추사는 ‘우연욕서(偶然欲書, 우연히 쓰고 싶어짐)’를 강조한다. 그 어떤 외부적 영향이나 구속이 철저하게 배제된 정신 경지, 절대적인 자유 경지라야 “서취(書趣, 서법에서 이는 흥취)도 천마가 허공을 나는 것 같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추사의 예술정신과 창작실천은 자신의 선지와 통한다.
어느 순간 과오를 깨닫고 헤매다 어느새 이름 모를 산사에 이르렀다. 무심코 바라본 감불(龕佛)은 자신에게 말을 건네는 듯하고, 이름 모를 산새들조차 반갑게 맞아준다. 감불의 위로나 계시 같은 것을 바라는 중생심에서 차와 꽃을 공양하는 추사의 불심을 읽을 수 있다. 자신을 눈물짓게 하던 공부도 부질없는 것이라는 추사의 울적한 심사가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속세를 벗어나 우연히 발길이 닿은 곳이 산사이고 그곳에서 무심코 찾은 것이 “담담한 봄”이었다. 이 시에서 “담담한 봄”이 추사가 찾고자 하는 진체가 아니었을까?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문득 산사로 돌아가고 싶은 추사의 심사가 드러나 있는 시이다.
〈산사구작(山寺舊作)〉
側峰橫嶺個中眞
枉却從前十丈塵
龕佛見人如欲語
월간불광 특집 기사 전문은
유료회원에게만 제공됩니다.
회원가입후 구독신청을 해주세요.
불광미디어 로그인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