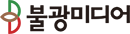Ⅰ. 가릉빈가란?
가릉빈가는 범어 가라빈가(Kalavin ka)의 한자표기로 달리 가릉비가(伽陵毘伽)·갈수가라(鞨隨伽羅)·가란가(加蘭加)라는 여러 이름으로 불린다. 또한 의역하여 호음조(好音鳥)·옥조(玉鳥)·묘음조(妙音鳥)·미음조(美音鳥)라고 하는데, 『대지도론』 권28에는 “알 속에서 깨어나기 전에도 울음소리를 내며, 그 울음소리가 세상의 어떤 새와도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다.”고 하여 소리가 아름답다는 기록과 부합되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또 극락정토에 깃들인다 하여 ‘극락조(極樂鳥)’로도 불린다. 상체는 사람의 모습을 취하고 하체는 새인 인두조신(人頭鳥身)의 모습으로, 형상을 살펴보면 몸에는 비늘이 돋고, 머리에는 새의 깃 장식이 달린 화관을 쓰며 악기를 연주하거나 합장을 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Ⅱ. 불교미술과 가릉빈가
『십주비바사론』 권8 「공행품」에서는 “여래의 음성은 대범천왕(大梵天王)의 것과 같은데, 가릉빈가의 울음소리와 같이 아름답고 곱기 때문에 범음상(梵音相)이라 한다.”고 하여 부처님의 형상을 전하는 32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가릉빈가는 봉황이나, 희말라야 산에 사는 공작새의 일종인 불불조(Bulbul鳥)로부터 기원했다고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고구려 고분인 덕흥리 안악 1호분 벽화에 처음 등장한다.
불교조형물 중 연꽃과 사자 다음으로 즐겨 사용하였는데, 각종 기와·쌍봉사 철감선사탑·법천사 지광국사현묘탑 등 석탑과 부도 등에 다양한 자세로 표현하였다. 특히, 고려시대 부도에는 예외 없이 등장하는데 열반에 드신 스님들을 극락으로 모시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닐까.
사진1은 일본 오따니(大谷) 탐사대가 20세기 초 중앙아시아 위구루 지역에서 발견한 목제사리기로 표면에 다양한 인물상을 그림으로 조식 하였다. 주목되는 것은 우측 하단의 날개 달린 인물상으로 기독교의 천사와 비교되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예로부터 새는 인간과 하늘, 혹은 신과의 교감을 전해주는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그렇기 때문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신과의 교감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왔던 것이다.
또한 날개 달린 인물상 사이로 두 마리의 새가 서로 마주 보는 자세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것 역시 동양 불교미술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로 서역미술의 영향을 짐작케 해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조형물로 크게 유행한 것은 통일신라부터로, 초기에는 사진2와 같이 극락조를 즐겨 사용하다가 점차 직접적인 조형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다.
가릉빈가는 보통 세 가지 형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새의 형상을 취하고 연화좌 위에 서서 화관을 착용하고 공양물을 들고 있는 것(사진3), 반좌향한 자세로 상체의 인신(人身)은 두 팔을 높이 치켜든 자세, 또 다른 하나는 주로 기와에 전면을 가득 채우고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다.
사진4는 악기를 연주하는 형식으로 고려 승려 지광국사 해린(984~1067)을 기리기 위한 부도다. 치켜올려진 지붕돌 각 면에 봉황과 함께 날개를 벌리고 있는 가릉빈가를 세련된 수법으로 조각하였다. 마치 죽어 있는 돌을 들어올려 극락으로 날아오르려는 느낌을 들게 하는 가릉빈가 표현의 백미라 할 수 있다.
Ⅲ. 범음의 전달자
여래의 음성을 특별히 범음(梵音)이라고 하는데, 그 소리를 듣기만 해도 번뇌의 깊은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위력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가릉빈가를 조형으로 즐겨 사용한 것은 바로 미혹의 깊은 늪에서 헤매고 있는 중생의 바른 길을 제시하는 동시에,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려던 옛 사람들의 바람이 아니었을까….
[불교문화 산책] 가릉빈가(迦陵頻伽)
- 관리자
- 승인 2007.10.0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교문화 산책/범음(梵音)의 전달자
저작권자 © 불광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