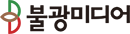이탈한 자가 문득
김중식
우리는 어디로 갔다가 어디서 돌아왔느냐 자기의 꼬리를 물고 뱅뱅 돌았을 뿐이다 대낮보다 찬란한 태양도 궤도를 이탈하지 못한다 태양보다 냉철한 뭇별들도 궤도를 이탈하지 못하므로 가는 곳만 가고 아는 것만 알 뿐이다 집도 절도 죽도 밥도 다 떨어져 빈 몸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보았다 단 한 번 궤도를 이탈함으로써 두 번 다시 궤도에 진입하지 못할 지라도 캄캄한 하늘에 획을 긋는 별, 그 똥, 짧지만, 그래도 획을 그을 수 있는, 포기한 자 그래서 이탈한 자가 문득 자유롭다는 것을
- 시집 「황금빛 모서리」(문학과 지성사) 중에서
김중식 _ 1967년 인천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문학사상」에 시를 발표하면서 등단했다. ‘21세기전망’ 동인이며, 시집으로 『황금빛 모서리』가 있다.
시 평
이 시는 자신의 삶에 대해 진정한 주인공이 되지 못하게 하는 일상의 강한 구속에 대한 비유를 담고 있는 작품이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일정하게 정해진 궤도로 만들어진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오늘, 그리고 오늘과 다르지 않은 내일을 살아갈 숙명 속에 있다는 점에서 인간 또한 ‘하루살이’의 가벼운 존재감을 동일하게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런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바로 ‘주인공’이 되지 못한 채 ‘물화(物化)’ 되어버린 인간의 특성이다. 이 시에서 궤도를 이탈하지 못하는 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뭇별의 왕인 태양도, 별들도 모두 마찬가지이다. 그러니, 이런 삶 앞에서는 모든 권력자도, 영웅도 결국은 주어진 궤도를 따라 뱅뱅 돌다가 갈 뿐이다. 그저 자기의 그림자, 혹은 꼬리를 따라 뱅뱅 도는 삶, 윤회의 법칙도 어쩌면 이런 궤도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 시에서 가장 ‘절정’은 이런 궤도를 깨는 자, 그것이 하찮은 별똥별, 포기한 자, 이탈한 자, “집도 절도 죽도 밥도 다 떨어져 빈 몸”인 자라는 사실이다. 시인이 스스로 이탈한 자가 되어 ‘빈 몸’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깨달은 것은 진정한 삶의 주인공이 되는 법, 그것이 포기하고 궤도를 이탈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두 번 다시 궤도에 진입하지 못할 지라도” “캄캄한 하늘에 획을 긋는 별”이 된다. 그는 궤도를 이탈함으로써 이미 정해진 자기의 ‘꼬리’를 버리고 자기 삶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이탈, 포기, 빈 몸의 자유를 이 ‘별똥’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과정에서 우리는 한 순간의 ‘이탈’, ‘자유’일지라도 짧지만 세상에 자신의 ‘한 획을 긋는’ 진정한 자아의 탄생을 이렇게 목격하게 된다. 이 시의 진정한 묘미는 바로 이런 ‘순간의 미학’을 보여준 면에 있다. 우주의 모든 장엄한 궤도를 이탈한 반란, 이탈, 포기의 참가치를 보여줌으로써 시인은 ‘영원성’의 궤도를 뱅뱅 도는 우주의 대척점에 아주 작은 ‘별똥’을 위치시킨다.
이 작고 사소한 존재인 ‘똥’은 거대자본, 현대성, 메커니즘화된 일상에 맨몸으로 맞서는 ‘사적 개인’의 상징이기도 하다. 아주 작고 사소하며 결국은 순식간에 소멸되어 버릴 ‘짧은 한 획’을 긋는 삶이지만, 그는 그 소멸의 미학이 지닌 진정한 ‘주체성’과 ‘자유’를 보여준다.
영원에 대한 욕망, 안정을 포기함으로써 별똥에 투영된 시인의 자아가 얻은 것은 아주 짧은 순간의 자유, 진리이지만, 그는 “그래도 획을 그을 수 있는” 포기한 자, 그러나 역설적으로 자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자의 모습으로 이탈의 자유를 말한다. 궤도를 벗어났으나 비로소 그 순간, 자신만의 궤도를 갖게 되는 ‘별똥’의 역설, 그 속에 ‘이탈과 포기’의 진정한 의미가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_____________________
김춘식 _ 문학박사, 문학평론가. 1992년 「세계일보」 신춘문예에 문학평론이 당선되어 등단하였다. 현재 동국대 국문과 교수, 계간 「시작」 편집위원이며, 평론집으로 『불온한 정신』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