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길 나의스승 | 글. 백운 스님(부산 미륵사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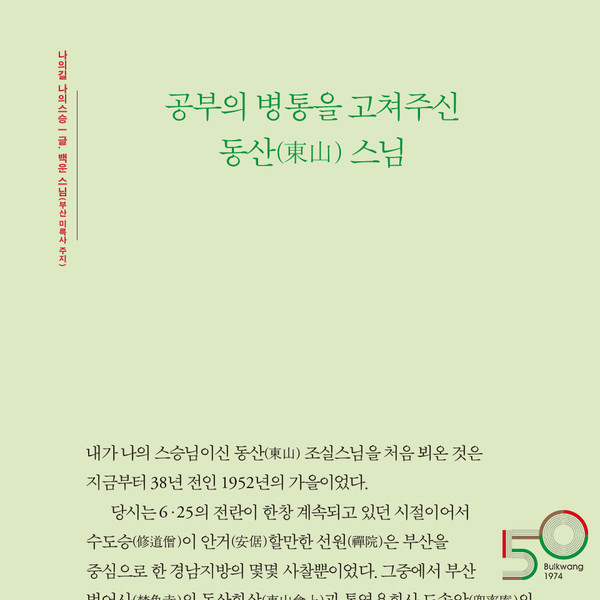
내가 나의 스승님이신 동산(東山) 조실스님을 처음 뵈온 것은 지금부터 38년 전인 1952년의 가을이었다.
당시는 6·25의 전란이 한창 계속되고 있던 시절이어서 수도승(修道僧)이 안거(安倨)할만한 선원(禪院)은 부산을 중심으로 한 경남지방의 몇몇 사찰뿐이었다. 그중에서 부산 범어사(梵魚寺)의 동산회상(東山會上)과 통영용화사 도솔암(兜率庵)의 효봉회상(曉峰會上)이 큰스님이 계심으로 해서 가장 으뜸이었고 부산 선암사(仙岩寺)·창원 성주사(聖住寺)·진주 은석사·부산 금정사(金井寺) 등이 수도승들의 안식처였으며, 그 외의 많은 사찰은 전란으로 비어 있거나 대처승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나는 임진년(1952년) 여름을 영암 땅 백련사(白蓮寺)에서 은노스님(恩師祖)이신 만암종정(曼庵宗正) 노스님을 모시고 주경야독하며 안거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노스님께 『치문(緇門)』을 떼고 『서장(書狀)』을 배우고 있었는데 선문(禪文)이 너무도 어려워 질문하는 횟수가 자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었다. 노스님께서는 나의 끈질긴 질문에 진력이 나셨던지 결국에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선(禪)이란 언어 문자를 통해서 입문하는 것이지만 언어·문자에 얽매임이 없이 실참실구(實參實究)를 통해 언어 이전의 소식을 깨쳐야 하느니라.”
결국 선은 스스로 참구(參究)해야 한다는 말씀이었다.
이에 자극을 받은 나는 그해 여름 내내 뙤약볕에서 황무지를 개간하며 말속으로 실참실구 하는 선원으로 가리라고 천번 만번 다짐하곤 했다. 그래서 추수절에 접어들어 지죽사형(知竹師兄)과 함께 부산을 향해 완행열차에 몸을 실었다.
당시의 교통 사정은 형편없어서 우리는 사흘 만에 부산에 닿을 수 있었다. 며칠을 시내 몇몇 사찰을 순방하며 난생처음 온 부산을 구경도 하고 선배스님들을 예방도 하다가 동래온천에서 목욕을 하고 범어사로 올라갔다.
전라도 촌뜨기(?)인 두 납자를 인도해준 이는 비룡(飛龍) 스님이었다. 마침 범어사 금어선원(金魚禪院)에서는 겨울 김장 준비로 한창 바빴는데 해제 철이라 거의 출타하고 몇 분 안 되는 선객 스님네가 연일 중노동을 하고 있었으므로 한꺼번에 세 사람이나 입방하게 되니 모두들 반갑게 맞아 주었다.
조실스님은 지죽사형과 나를 매우 따뜻이 맞아 주셨다. 백양사(白羊寺)가 본사(本寺)라고 말씀드렸더니, 조실스님의 스승이신 용성(龍城) 큰스님이 백양사 운문암(雲門庵) 조실로 계셨던 일이며 당신께서도 운문암에서 안거하셨던 일 등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는 덧붙여 이르시기를,
“우리 스님께서 운문암 조실로 계신 것은 순전히 만암(曼庵) 스님의 배려로 이뤄진 것이었다”고 하시며 나의 은노스님을 극구 찬양하시는 것이었다.
이윽고 결제(結制)가 시작되었다. 결제 전날 밤 방(榜)을 짜는데 나는 간병(看病)과 산신각 지전(持殿)의 소임을 맡았다.
범어사의 겨울철은 부산시내와는 달리 매우 추웠다. 아무리 겨울철이지만 운수납자(雲水衲子)로서 솜옷은 그림의 떡만큼이나 귀했고 운(?) 좋은 이는 겹옷을 한 벌쯤 갖고 있었고 대개 홑옷이 고작이었다.
나는 홑옷 두벌을 껴입다가 겉옷이 때에 찌들면 그것만 빨아 다시 입곤 했다. 그러나 홑옷을 껴입는 것으로 추위를 이겨내기는 어려웠으므로 어떤 선배스님에게 누더기 한 벌을 얻어서 겨울 내내 입고 정진했으며 잠잘 때는 이불 삼아 배를 덮고 자곤 했다.
그런데 방을 짤 적에 조실스님 시자(侍子)로는 조실스님 상좌인 지환(智還) 비구를 정했는데 그 당시 직지사(直指寺)에 다니러 가서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나도 시자는 오지 않았는데 한번은 우연히 조실스님 방 쪽을 바라보니 조실스님이 응접실로 사용하는 마루청을 손수 쓸고 닦으시는 것이었다. 나는 삭발 본사에서 노스님을 시봉해본 경험이 있었으므로 본능적으로 달려가서 조실스님께 걸레를 뺏다시피(?)하여 신속한 동작으로 청소를 해드렸다.
청소를 마치니 조실스님께서 방안으로 부르시더니 고맙다고 하시며 본사에서 스님네 시봉을 해봤느냐고 물으시고 시자가 올 때까지 수고 좀 해주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한데 조실스님은 단 한마디도 ‘해라’의 말씀을 안 쓰시고 꼭꼭 경어(敬語)를 쓰셔서 적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너무도 송구스러워서 시봉 드리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낮추어 주십시오 하고 간청했지만 쉬 바꾸지 않으시더니 달포가 지나서야 ‘하게’ 정도로 낮추시고 이듬해 봄에 접어들어 비로소 ‘해라’로 낮추어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천하의 대선지식(大善知識)이신 동산 조실스님께서 아랫사람한테 존댓말을 쓰신다는 것은 내 상식으로는 정말 납득이나 이해가 되지 않았다.
계사년(癸巳年) 정월보름의 해제를 며칠 지난 어느 날 내 또래의 두 납자가 조실스님을 뵈러 왔다. 조실스님은 예외 없이 두 납자에게 정중히 무릎을 꿇은 채 절을 받으시고는,
“어디서 오신 스님이시오?”
새로 찾아오는 스님들에게 으레 갖추는 예의요 물음이었다.
그중 한 납자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고개를 숙이고 대답하기를,
“저, 스님 시봉 아닙니꺼?”
강한 경상도 사투리로 대답을 하니 그제야 눈을 크게 뜨시며,
“늬 언제 중 되었노?”
당신의 상좌라 하니 이렇게 되물으시는 것이었다.
계사년 여름철의 일이었다. 나는 지난겨울에 자청해서 조실스님 시자가 된 이래 줄곧 조실스님을 시봉하면서 정진하고 있었다.
여름철의 중반쯤 되었을 무렵, 나는 초저녁에 포관에 앉으면 이튿날 아침공양 때까지 전후좌우를 잊고 아주 편안한 경지에 몰입하여 시공(時空)을 잊곤 했는데 이웃의 도반이 공양시간이라며 흔들어 깨워 주면 그제사 일어나곤 했다.
밤 아홉 시 방선(放禪) 죽비가 울리면 조실스님 모시고 방으로 가서 스님이 자리에 누우시면 “안녕히 주무십시오” 하고 큰절을 올리고 물러 나왔다.
또 새벽 세 시에 첫 목탁이 울리면 등불을 켜 들고 가서 조실스님께 첫인사를 올렸다. 등불은 조실스님이 법당에 나오시며 들고 다니시는 이른바 플래시용이다.
당시는 조실스님께 플래시 하나도 사드릴 형편이 못 되었지만 조실스님은 등불을 들고 다니시는 걸 퍽 좋아하셨다. 그 등불도 내가 시봉을 드리면서 마련해 드린 것이었다.
초저녁 예불이 끝남과 동시에 바로 입선(入禪)에 들어가면 밤 아홉 시에 방선을 하고 나는 으레 조실 방으로 가서 스님께 인사를 드리고 나와야 하는데 이러한 시자로서의 임무를 며칠을 거르고 난 어느 날 조실스님은 정중한 음성으로 물으시는 것이었다.
“요즘 네 생활에 작은 변화가 생긴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었더냐?”
나는 시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못내 죄송하게 여기면서,
“실은 제가 초저녁에 입선하여 다음 날 아침까지 고요하고 편안한 경지에 몰입하곤 하느라 결례를 했습니다.”
“응? 그렇느냐? 한데 그때 화두가 챙겨지던가?”
“화두고 뭐고 온갖 생각이 끊어져서 적적요요(寂寂寥寥)할 따름입니다.”
“음‐‐ 그렇느냐? 그 고요한 경지에 들되 화두를 꼭 챙겨야 한다. 화두를 놓치면 안 돼.”
너무도 진지한 태도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어서 나는 적요한 경지에서 화두를 들려고 미리 맘먹곤 했지만 일단 적요한 경지에 들 적에는 화두는 벌써 십만팔천 리였다.
연일 조실스님은 더욱 화두가 들리더냐? 하고 다그치셨지만 매번 허사였다.
적요한 경지에서 간혹 새벽 목탁석을 하는 노전스님의 염불 소리를 듣곤 했는데, 이번에는 그 염불소리에 맞춰 숲을 스쳐 가는 바람 소리며 계곡에서 우렁차게 들리는 개울물 소리 등이 모두 노전스님이 외우시는 천수경으로 동화(同化) 합일(合一)되어 온 천지는 천수경 소리로 가득 차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처마 끝에서 울리는 풍경소리도 천수경 소리였고 낮에 관광객으로 붐비는 창밖의 소음들도 모두 천수경으로 화하여 아늑한 자장가처럼 나를 더 편안하고 고요롭게 해주는 것이었다. 나는 화두 대신 천수경으로 고요한 경지에 몰입해 시공을 잊곤 했는데, 매일 점심공양 후에 조실스님께 호된 채근을 받았다.
“화두를 잡으래도 화두를‐‐. 선객이 평소에 화두를 놓치면 끝장이지. 천수는 난데없이 웬 천수냐? 꼭 화두를 챙겨야 한다.”
이런 나날이 벌써 보름을 흘러갔다. 그러던 어느 날 첫새벽에 그 고요로움에서 깨어나 현실로 돌아오자 나는 무자화두(無字話頭)를 들어봤다.
“조주(趙州)는 인심도무(因甚道無)오?”
아, 그런데 이 무슨 이변인가? 반달 이상을 챙기지 못했던 화두가 목전에 뚜렷이 현전하여 차츰 온 누리에 가득 차는 것이었다. 여태껏 온갖 소리들이 천수경으로 화했듯이 이제는 온갖 소리들이 나와 함께 “조주는 인심도무오(趙州因甚道無)?”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화두가 소소영령(昭昭靈靈)하게 들려진 적은 일찍이 없었던 터여서 나는 조실스님을 시봉하는 일들이 모두 화두 하나로 모이자 조실스님께 자신 있게 화두를 챙겼습니다 하고 여쭸다. 조실스님은 그제야 ‘후’ 한숨을 쉬시고는 밝은 안색이 되셔서,
“너는 비로소 무기공(無記空)의 늪에서 탈출해서 정상공부(正常工夫)로 돌아온 거다” 하시며 무기공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하안거를 마친 후 음력 9월에 조실스님은 손수 입실(入室)을 허락하는 게문(偈文)을 써 주셨다.
“松月堂知興丈室(송월당지흥장실)
庭前柏樹子(정전백수자)
先師未會設(선사미회설)
箭穿江月影(전천강월영)
應是射鳥人(응시사조인)
송월당지흥장실
뜰앞의 잣나무란 말씀
선사께서 일찍이 설하지 않으셨네
화살이 강 속의 달그림자를 뚫은 건
응당 새를 쏜 사람일레”
내게 입실을 허락하시고 전법게(傳法偈)를 주신 은혜보다 무기공(無記空)에서 헤어나게 해주신 그 은혜가 천배 만배 더 크다는 것을 나는 늘 마음에 새기고 있다. 공부 중의 병통을 고쳐주신 은혜로 나의 오늘이 있는 것이다.
1989년 7월호(통권 177호)에 실린 백운 스님의 글을 현대적인 문법으로 일부 교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