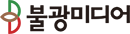깨달은 사람의 생활(4)
성 운 : 중국 佛光山寺宗長
眞弘옮김
13] 모순 중에서도 모순되지 않는다
깨달은 선사들의 이런 언행이나 관념은 우리 일반 사람들 생각으로는 이상하게 생각이 된다. 선사들 말씀에 “익주(益州)의 말이 풀을 먹으니 목주(牧州)의 소가 살이 쪘다.”고 한다. 이 말과 같은 비유를 들어 보자.
고웅(高雄)의 말이 풀을 먹으니 대북(臺北)의 소가 배가 불렀다. 이 말은 쉽게 이해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관념으로는 익주와 목주는 멀리 남북으로 갈려 있고, 소와 말은 전혀 종류를 달리한 동물이고 피차가 본질적 차이가 있다. 그런데도 어째서 일치한다고 하는가. 그러나 깨달은 자의 경계는 시공(時空)의 모순 장애로부터 오는 것을 조화시켜 피차와 물아(物我)의 대대차별(對待差別)이다. 그러므로 보는 바 세계는 중중무진한 원융통일(圓融統一)의 세계인 것이다.
부대사(傅大士)의 한 게송이 있는데 이런 종류의 모순된 것을 통일한 경계를 잘 표현해 준다.空手把金鋤頭 步行騎水牛
人從橋上遇 橋流水下流빈손에 호미자루를 잡고 물소를 타고 걸으니
사람은 다리 위로 걸어가고 다리는 흘러도 물은 흐르지 않는다.참선하여 깨달은 분을 보면 빈손은 호미자루를 잡을 뿐만 아니라 능히 온 우주를 움켜잡을 수 있으니 이것 또한 빈손이라야 능히 우주 허공을 움켜잡을 수 있으나 탐착하지 않는다. 깨달은 분에 대하여서 말하자면 수미산이 진실로 겨자(芥子)를 포용하고 겨자 또한 능히 수미산을 포용할 수 있으며, 비가 내리면 꽃이 떨어지고, 바람이 불면 버들솜이 날리는 것은 자연현상이지만 비가 오지 않는데 꽃이 떨어지고 바람이 없는데 버들솜이 스스로 나는 것은 또한 평상시에는 드문 일이다.
참선공부를 하여 깨달으면 우주의 본체와 현상과 현상 사이에 피차·모순·격애(隔碍)의 상태가 없어서 서로 융섭 조화한 관계인 것이다. 이와 같은 깨달은 자의 경계는 범부들의 어지럽고 의심스러운 견해로는 짐작하지 못한다. 오직 깨달아 체험하여 증득할 뿐이다. 그렇지 않고 말만 따라 선사들의 언행을 흉내 낸다면 호랑이를 그리려다 개를 그릴 것이니 천하가 웃을 것이다.
어떤 참선하는 젊은이가 노선사계서 들어오시는 것을 보면서 일어나 마중하지 않고 뻣뻣이 앉아 있었다. 선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젊은이야, 늙은이가 오는 것을 보면 일어아 마중해야 하지 않느냐? 어째서 예의를 모르느냐?”
젊은 학인이 말했다.
“제가 앉아서 스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일어서서 스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선사가 이 말을 듣자마자 번쩍 손을 들어 젊은이의 귀뺨을 때렸다.
젊은이가 화를 냈다.
“스님, 왜 때립니까?”
선사가 말했다.
“내가 네 뺨을 때린 것은 곧 너의 귀뺨을 때리지 않은 것이다.”선은 세간의 총명이나 지혜로 알아 맞추는 것이 아니며 이러저러한 모양을 지어서 맞추는 것도 아니다. 깨달은 연후에 지혜가 자연히 흘러 나는 것이지 한 뼘만한 생각으로 모방해서 얻는 것은 아니다.
14] 망심 중에 있어서도 망심이 없다
부처님을 정성스럽게 믿고 계율을 엄하게 지키던 왕거사(王居士)는 평상시에 말과 행동을 조심하여 뭇사람들의 공경을 받았다. 그런데 그와 같이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황혼이 물들 때가 되면 혼자서 뒷골목 화류계를 찾아 간다는 소문이 났다. 스스로 엄숙한 계행을 지킨다는 왕거사가 여색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스스로의 깨끗한 명예를 헐을 수 있을까.
여러 사람들이 뒤에서 의논이 분분했다. 어떤 일 좋아하는 사람이 호기심으로 어느 날 왕거사의 뒤를 밟았다. 길을 건너 골목을 들어서 취화각(翠花閣)이란 집에 이르니 안에서 아름다운 아가씨들이 왕거사를 반가이 맞아 정중히 인사를 하고 여럿이 부축하여 이층으로 올라갔다. 젊은이가 바짝 호기심이 나서 살폈다.
그러나 그는 감격스런 장면에 부딪치자 그만 굴복했다. 방금까지 시시덕거리던 아가씨들은 하나하나 옷을 바로 입고 불당 앞에 앉아서 정중하게 왕거사의 설법을 듣고 있었다. 왕거사는 생사가 넘실대는 중생세계에 와서 법륜을 굴리니 더러운 곳에서도 더러워지지 않고 불무더기 가운데 연꽃을 심었으니 욕뇌(欲惱)를 교화하여 청량을 얻게 한 것이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산으로 가야 한다는 말과도 같고, “내가 지옥에 들어가지 않으면 누가 지옥에 들어가겠는가”라고 한 지장보살 자비심이 가슴에 꽉 차 있었던 것이다. 왕거사는 시끄러운 곳을 법도량으로 만들었고 망경계에 있어도 동요하지 않는 정력(定力)을 이룬 것이니 실로 선하는 자는 연을 따라 빛을 발하고 임의대로 소요하는 묘행(妙行)을 보인 것이라 하겠다.15] 분별 중에 있되 분별이 없다
약산(藥山)선사가 어느 때 산에서 경행하고 있을 때 두 그루의 나무를 보았다. 한 그루는 크고 대단히 무성하고 한 그루는 잎이 지고 말라 있었다.
그때 그의 제자인 도오(道悟)·운암(雲巖) 두 사람이 걸어왔다. 약산선사가 그들에게 묻기를 “너희들 말해 보아라. 어떤 나무가 보기 좋으냐?” 도오가 말했다.
“무성한 저 나무가 보기 좋습니다.” 약산선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운암은 반대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마른 나무가 보기 좋습니다.” 약산선사 또한 고개를 끄덕였다.
옆에 있던 한 시자가 약산선사에게 물었다. “스님! 무성한 것이 좋다고도 하시고 마른 나무도 좋다 하시니 도대체 어떤 나무가 아름답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너는 어떤 나무가 보기 좋다는 것이냐?”
“가지와 잎이 무성한 나무는 생기발랄해서 좋고 잎이 진 나무는 또한 옛 뜻을 많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모든 법은 본래로 자성(自性)이 평등일여하여 선악과 미추(美醜)·고하(高下)·귀천(貴賤)의 분별이 없으므로 선하는 자의 안중에는 무성한 나무나 고목나무나 같이 보기 좋은 것이다.
유마경에는 천상의 보살과 이승(二承)·라한(羅漢)들이 유마보살 방에 모여 유마보살이 불이(不二) 법문을 강설하는 것을 듣고 기뻐서 천녀들이 하늘에서 아름다운 꽃송이를 분분히 내려 보살께 공양하였다. 그리고 마음에 깨달은 바를 말하며 보살을 찬탄하였다. 이러한 아름다운 꽃송이는 대보살의 몸에는 가볍게 자연스럽게 떨어졌지만 이승 라한님들의 몸에는 꽃을 붙인 것 같아서 흔들어도 꽃이 떨어지지 않았다.
금강경에 말씀하셨다. “무릇 형상은 다 허망한 것이다”하였는데 이승인의 마음에는 아직도 꽃 모양·몸 빛깔에 허망한 차별심을 일으켜 꽃을 집착하므로 이 때문에 꽃이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다.
대승보살은 모든 법의 성품이 공한 것을 알아서 일체 거짓된 형상을 벗어나니 설사 백 가지 꽃 속을 지나가더라도 꽃잎 하나 몸에 붙지 않거니 하물며 꽃송이가 하늘에서 내린들 걸림이 있을 리 없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