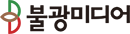함께 사는 세상 이렇게 일굽시다
불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꼬살라국 빠세나디 왕과 마가다국 빔비사라 왕은 당대 대국의 왕들로서 모두 부처님께 귀의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초기 경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 두 왕들은 모두 부처님과 승단을 외호(外護)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큰 정사(精舍)가 부처님께 기증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인도 역사를 보면, 당대 여러 나라들 중에서도 이 두 나라 왕들이 가장 일찍 영토 확장에 나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성공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의 수단은 모두 폭력과 살생, 슬픔과 두려움을 일으키는 전쟁이었습니다.
경전에 자주 나오는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은 부처님께서 자주 머무시던 곳입니다만, 이 곳은 빠세나디 왕과 그 아들 유리(비루다까)왕이 다스리던 꼬살라 국의 수도 남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태어나신 카필라 국이 바로 이 꼬살라 국 유리왕에 의해 멸망당했던 것입니다. 이 때 부처님과 같은 왕족인 석가족이 몰살을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침략, 살육, 약탈을 의미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한편 마가다 국의 빔비사라 왕과 그 아들 아지따삿투 부자(父子)가 이룩한 전쟁의 승리와 영토확장은 역사에 유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가들도 그 짧은 기간에 이 나라가 얻은 승리의 원인을 찾아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일설에는 빔비사라 왕이 개발한 돌 대포가 막강한 전력의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큰 돌을 대포로 쏠 때 결국 얻어맞는 대상은 사람이요 짐승들이니, 그 파괴력은 결국 생명과 재산에 대한 엄청난 폭력과 살상입니다.
부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세도(勢道)가 큰 왕들이 당신에게 귀의한 이래, 불교교단의 위상과 대중의 존경이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상 이 왕들은 살생과 폭력, 약탈, 거짓, 음란 등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많이 어긴 자들입니다. 앞에서는 당신의 법문을 듣고 부처님께 귀의하고는, 뒤돌아서서는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죽이고 빼앗는 짓을 한 것입니다.
이런 왕들이 저지른 전쟁의 참상을 보신 부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세상의 무상함과 무아(無我)를 일깨우고, 자비와 평화를 가르치는 부처님에게 이 왕들의 귀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왕들의 귀의가 진정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제자로서의 귀의일까요, 아니면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였을까요? 물론 지금의 잣대로 그 때의 현실이나 삶을 쉽게 가치판단을 할 수도 없겠지요. 그러나 대국의 왕들이 부처님께 귀의하겠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누구라도 그들의 귀의를 물리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부처님께서는 이런 왕들에게 생명에 대한 사랑과 자비를 말씀하시고, 아무리 강한 군대나 권력이 있더라도 자신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막아낼 수는 없다는 무아(無我)의 가르침을 전하십니다.
죽을 위험을 무릅쓰며 전쟁을 일으킨 왕들이 힘들게 얻은 자신의 소유와 지위를 버릴 수 있을까요? 지난 세월 독재정치로 온갖 어려움을 겪으며 민주화 운동을 실천해온 정치인이나 단체 지도자들이 정작 자신의 기득권은 쉽게 버리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자주 보았습니다.
이런 문제가 과연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끊임없는 경쟁, 남에 대한 무관심, 인색함 등의 욕망은 피할 수 없는 것일까요? 부처님을 따르는 우리 자신이 남과 경쟁하고 내 것만을 지키는 삶을 살 때, 과연 우리 아이들이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불자(佛子)의 길을 선택할까요?
꼬살라 국의 유리왕이 카필라로 쳐들어갈 때, 전쟁이 곧 폭력, 살생, 약탈을 의미하는 것을 아시는 부처님은 길에서 세 번이나 전쟁을 반대하는 뜻을 전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전쟁의 참화를 일깨우고자 몸소 길에 서서 전쟁을 말리신 것입니다.
미국과 함께 이라크 전쟁에 참전하기로 결정했던 대통령이 어찌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우리 나라가 누리는 무역 흑자의 많은 부분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누가 대통령이라도 미국의 뜻에 거스르는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서로 의존하는 관계가 결국 원치 않는 전쟁에 참여하도록 강요하는 관계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의존하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사랑과 연민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관계가 폭력까지 함께 추종해야 하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런 강요가 없을까요?
외국인 노동자를 도울 때, 그 도움의 대가로 자기 종교를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을 이따금 봅니다. 이런 태도가 과연 종교적인 태도일까, 이것은 혹 은혜를 베풀며 그들의 영혼을 사려는 것이 아닐까 묻게 됩니다.
가르침(法)마저 뗏목으로 보라는 금강경의 법문을 생각하며, 나 자신이 과연 상대방의 문화나 종교를 존중하고 있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당신에게 귀의하는 자이나 교도에게 앞으로도 그가 믿던 교주를 잘 봉양할 것을 당부하셨으니, 생명에 대한 자비를 가장 귀하게 여기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쟁에 이기는 사람만이 잘 살게 되는 교육제도나, 부당한 폭력을 따라야만 편하게 살 수 있는 경제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과연 자비와 무아(無我)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불자의 길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전에는,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탐욕과 성냄, 폭력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으러 출가하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아직 깨닫기 전 보살이었을 때, 이미 이런 결심을 하시고 당신의 안락함을 버리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안락한 삶의 한 편에 탐욕과 폭력이 뿌리를 두고 있고, 우리 자신이 그 뿌리의 한 편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보여 부끄럽기만 합니다.
고통을 당하는 모든 생명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그 고통의 짐을 지시는 부처님과 보살들을 생각하며 불자(佛子)의 길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저작권자 © 불광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