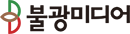흔히 붓가는 대로 쓰는 글을 수필이라고 한다. 그만큼 기분 내키는 대로 쓰는 글이라고도 하겠다. 이 말은 곧 시나 소설이 엄격한 형식에 얽매인 데 대해서 수필은 자유 자재로 행동 반경을 넓힐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산문이 보행(步行)으로 비유되고 음문인 시는 무용(舞踊)으로 비유하기도 한다. 수필은 어느 편이냐 하면 보행중에서도 우리가 조석으로 즐기는 산책과 같은 것이라면 그릇된 비유일까.
문학청년들이 대부분 습작시를 쓰면서 문학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된다.
이렇게 습작시를 써가는 동안 혹은 소설로 전향을 하거나 혹은 평론쪽으로 기울어가기도 한다. 아주 문학을 포기하는 이도 생기게 된다. 영국의 수상을 지낸 처칠도 한때 문학 청년 시절을 보냈던 시기가 있었다. 이것은 비단 처칠의 경우에만 한하랴.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로 시는 20대에, 소설은 30대 이후에 쓰게 된다는 통설(通說)도 나오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견해가 옳고 그른지는 차치하고 그것이 어떤 진실을 내포한 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에 일단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 아까도 말했지만 습작시를 쓰는 시기가 대체로 감정이 넘쳐나는 20대 전후가 될진대 그렇고, 다소 인생의 경험을 쌓은 30대 이후에 소설을 쓴다는 것은 이해하기에 무리가 아니다. 이러한 견해를 수긍하는 사람 가운데는 수필에 대해서 인생의 경험을 웬만큼 쌓게 된 40대 이후라야 된다는 주장을 내세우게도 된다. 물론 조숙형(早熟型)의 사람과 대기만성형(大器晩成型)의 사람에 따라서는 이러한 연령의 벽은 달라질 수도 있겠다.
앞서 산문이 보행으로 비유되었고, 음문인 시가 무용으로, 그리고 수필이 보행중에서도 산책으로 비유하기도 했다. 산책이란 행하기에 따라서는 보행으로 하되 리듬을 밟는 무용과 같은 기분으로 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볼라치면 수필은 그 어딘가에 조금은 여유가 있고, 틀에 박히지 않은 그런 자유로움이 있다. 저 시가 갖는 엄격한 형식에 얽매인다거나 소설의 구성이나 주제의식의 격의없는 전개, 에피소드의 상호 유기적인 연결이라든가 하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아도 수필은 유연하게 붓가는 대로 쓸 수 있는 것이다. 아무래도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넘치는 감정이나 단편적인 인생의 경험에서 보다는 성숙한 사고의 편모가 있어야 마땅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결코 수필이 시나 소설의 상위 장르라는 말은 아니다. 우리 인류가 남긴 위대한 문학작품의 주류를 이어온 것은 말할 나위도 없이 시와 소설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구태여 장르별로 따진다면야 시와 소설은 문학에 있어서 단연코 으뜸의 장르요, 그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특히 현대의 특징의 하나는 저널리즘의 발달로 말미암아 다양한 에세이류 즉 논픽션이다. 평전이다 해서 폭 넓은 산문의 요구가 작가나 시인에게 요구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말하자면 종래의 시인은 시만을 쓰고 작가는 소설만을 쓰게끔 각종 저널리즘에서는 놓아주지를 않는다.
이러한 현대적인 문화의 흐름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러서 시인도 작가도 기회있는 대로 에세이류를 매만지게 된다.
우리나라 작가로는 이효석(李孝石), 이상(李箱), 노천명(盧天命), 김기림(金起林), 정기용(鄭其溶), 신석정(辛夕汀)등 유수한 시인의 수필도 빼놓을 수 없다. 이들의 수필을 읽을라치면 시나 소설에서 보이던 역량이나 재질이 수필에서도 약여(躍如)하다. 역시 일류 시인이나 작가가 좋은 수필도 쓰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김진섭(金晋燮), 민태원, 피천득(皮千得), 한흑구(韓黑鷗) 등 본격적인 수필가의 작품에서도 날카로운 면모를 본다.
그러나 우리는 수필을 협의로만 생각할 일은 아니다. 서구의 에세이라고 불리는 것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협의의 수필만이 아니라 보다 더 광의의 내용을 갖고 있다. 감상문, 기행문, 일기, 수기 따위를 비롯해서 각종 평론을 통틀어서 에세이의 범주에 넣고 있는 것이다.
하기야 어쩌다 우리나라의 평론을 본다면 문장이 너무 딱딱하고 지나치게 관념어만을 나열한 논리의 추구 때문인지 글을 읽고 나서 재미를 느끼기가 어렵다. 문학평론이 아무리 의미 내용을 중시하는 문장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딱딱하고 지나친 관념어의 나열이거나 추상적인 논리의 추구로 내달린다면 거기서 발달한 문장의 묘미를 맛보기란 어려우리라.
모든 글이 그렇거니와 수필은 단지 붓가는 대로 쓸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즐겨 산책을 하듯이 절로 마음 속에서 우러나는 그런 향취와 여운이 풍겨나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되리라. 그것은 마치 깊은 산골짜기 옹달샘에서 맑고 맑은 물줄기가 소리없이 솟아나듯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