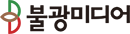일반적으로 윤리라고 함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말한다. 이 관계란 상호간의 행위 제약(行爲制約)에서 비롯 된다. 따라서 윤리는 대부분 행위의 개방보다 행위의 제약과 구속을 의미 한다. 전통적인 고전윤리학의 명제는 「이러 이러한 행위는 해서는 안된다」라는 식의 형식적 규범이 내재해 있다. 왜 그러한 행위는 해서는 안되는가의 근거는 인간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이라든가 또는 사회적 약속이 그렇게 되어 있다던가 하는 결절론위에 정립되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때문에 이러한 윤리 덕목은 현대적 지성의 개방성과 회의론 앞에서는 그 설득력이 약화된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왜 그 행위는 하지 않으면 안되고 이 행위는 해야 하는가? 하는 윤리적 실천덕목 또는 도덕률의 근거를 살펴 보아야 한다.
「칸트」는 실천이성비판(實踐理性批判)에서 저 유명한 말을 한 바있다. 『자유는 분명히 도덕법칙의 존재근거(ratio essendi)이나 그러나 도덕법칙은 자유의 인식근거(ratio Cognoscendi)라는 사실을 왜냐하면 만약 도덕 법칙이 우리 이성에 의하여 미리 분명하게 생각되지 않았다면 (비록 자유라는 개념에 자기 모순이 없을지라도) 자유라는 것이 있다고 상정(想定)할 권리를 우리는 생각할 리 없을 것이며 만약 자유가 없었다면 우리들은 결코 도덕법칙을 발견할 도리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칸트는 도덕법칙의 존재근거로 자유를 바탕으로 발견하고 체계화 했던 것이다.
오늘날 도덕의 문제는 대립과 차별과 갈등속에서 제기 된다. 인간의 존재가 개인적 존재로 한정되지 않고 집단이라는 사회적 관계에서 생존하고 있다. 따라서 이 속에서 자아를 정립하고 자아의 구체적 존재가 파괴된다. 인간은 한순간도 관계속에서 도피하고 생존할 수 없다. 그것은 사회적 환경과 자연적 환경의 제약이다. 이러한 제약을 인간은 나와 별개의 타자(他者)로서 대립시키고 갔다. 이 대립의 극복이 도덕률 또는 윤리라고 하는 조화(調和)의 매개체가 요구되는 것이다.
왜 인간은 대립을 극복하기 위한 윤리가 필요한가? 본래부터 윤리가 필요한 인간존재인가? 우리는 우리의 일상적 자아의 근원을 살피면서 윤리의 당위성을 추구하여야 한다. 이 당위의 근거가 애매하다면 우리의 모든 행위는 모래위에 지은 집과 같을 뿐이다. 이러한 문제를 불교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불교에 있어서 사회윤리라 하게 되면 거의 육바라밀(六波羅密)이나 사섭(四攝) 기타 대승불교의 윤리적 덕목을 들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왜 이것이 불교의 사회윤리의 근거가 되는가 하는 문제는 아직 뚜렷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윤리는 의지 실천의 구체적 명제이다. 또한 행위 선택의 요목(要目)이요 법칙이다. 불교에 있어서의 행위란 몸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과 입으로 말을 하는것과 뜻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위의 최고의 이상은 무엇인가 두말할 것 없이 그러한 행위의 목적은 열반(涅槃), 해탈(解脫), 각(覺)이다. 그러한 행위는 금지적 행위가 아니라 긍정의 행위이다. 규범으로서의 금지적 행위는 우리 존재의 실상을 은폐하는 것이다.
불교의 윤리 덕목은 절대 긍정의 실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사실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의지의 내용으로서 절대 명령이 아니라 본래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을 뿐임을 가르켜 주는 것이다.
금강경은 凡所有相, 皆是虛妄 若見諸相非相 見如來 (있는바 모든 상(相)은 허망하여 실체가 없으니 만약 모든 상(相)을 상(相)아닌 것으로 보면 곧 여래를 본다) 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현상에 나타난 일체의 질과 양과 형태와 관계를 진정한 사실로 보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다. 이것의 근거는 현상이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어떠한 일정한 특질로 제약함으로써 일어나는 오류를 지적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존재의 양태가 그러한 사실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내가 철저히 깨닫는 것이 곧 해탈이다. 이러한 깨달음, 해탈에서는 일정한 사회논리가 있을 수 없다. 바로 그것이 자유이요 그것이 무애(無碍)인 것이다. 자유는 그 존재의 비밀을 깨달아서 내가 그와 대립, 차별을 갖지 않는 곳에서 드러난다. 우리는 이미 윤리는 현상에 집착하고 그 현상을 고정불변한 실체로 보는 데서 대립과 차별의 갈등을 가져오게 되고 이 갈등의 소극적 해결이 윤리적 행위의 법칙으로 제시됨을 보아 왔다.
불교의 사회윤리의 근거는 곧 현실이 대립, 차별의 대상이 아니라 그와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로서 일치한다는 데 있다. 본래 동등, 무차별의 원융무애(圓融無碍)한 것인데 내가 그것을 대립시키고 차별 지었다. 막혀있는것이 아니라 뚫려 있었다. 상대적 부정이 아니라 절대적 긍정이요, 청정이다. 그것대로 본래 완전 구족되고 성취되여 있다. 단지 나의 대립의식이 본래 성취를 착각하여 오류의 어둠을 헤매고 있을 뿐이다. 금강경은 다시 말한다. 일체 유위법(有爲法) 如夢幻泡影, 如露亦如電 應作如是觀 (일체 함이 있는 모든 법은 꿈이며 환이며 물거품이며 그림자 같으며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도 같으니 응당 이와 같이 관할지니라) 이라고 말한다. 존재의 사실이 이러한 것이니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의 해결점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곧 불취어상(佛取於相)에 여여부동(如如不動)인 것이다. 즉 상(相)을 집착하고 그것에 동일율(同一律)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은 곧 보현 행원의 원력의 사상으로 직결 된다고 생각한다. 일체의 행위는 내가 반야바라밀된 그 상태에서 일어나야 한다. 그러기에 대립의식, 차별의식이 있을 수 없다. 모든 행위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 객관적 대상은 내가 성취한 내용이다. 그것은 장애가 아니다. 그것은 대립물이 아니다. 그것은 타자(他子)가 아니다. 나의 일부분이다. 그러기 때문에 慈와 悲가 있으며 그러기 때문에 喜와 捨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응무소주(應無所住)한 보시(布施)와 애어(愛語)와 동사(同事)와 이행(利行)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반야바라밀의 의지적 내용이 아니라 그 자체가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으로서 하나의 사실이다.
보현행원품의 광수공양(廣修供養)은 바로 이것의 실천이다. 해야하기 때문이 아니라 생명의 존재 사실로서 본래의 실상이다. 첫째 부처님이 말씀하신 정법을 띠끌만치도 의심없이 수행하는 것이요(如設修行供養), 둘째 모든 중생을 이익하게 하는 일이요(利益衆生生供養), 셋째 모든 중생을 섭수하는 것이요(攝受衆生供養), 넷째는 중생의 苦를 대신하는 것이요(代衆生苦供養), 다섯째는 보살의 정신으로 보살도를 버리지 않는 것이요(不捨菩薩業供養), 여섯째로는 보리심을 잊지 않는 것이요, 일곱째는 선근을 부지런히 닦는 것이다(勤修善根供養).
이러한 윤리덕목은 공양의 의미가 지시 하듯이 그대로 바치는 것이다. 그것은 나와 너가 둘이 아니요 하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철저히 주는 것이다. 그저 주는 것이다. 거기에는 논리가 필요하지 않다. 본래 나는 주는 것 속에서 나로서 전체로 나타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