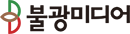●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후 45년, 머문 곳에 심한 가뭄이 와서 많은 비구들이 한꺼번에 걸식하기 어려웠다. 제자들을 인근 지역으로 흩어져 걸식하게 떠나보내고, 당신도 아난다와 함께 벨루와에 계셨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심한 병을 앓았고, 이를 옆에서 지켜본 아난다는 부처님의 열반을 염려하며 말한다. “세존께서 계시지 않는 승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저희를 가엾이 여겨 부디 이 땅에 오래오래 머물러주소서.” 늙은 시자의 눈물을 측은히 바라보던 부처님께서 말씀했다. “아난다, 내 나이 여든이다. 이제 내 삶도 거의 끝나가고 있구나. 여기저기 부서진 낡은 수레를 가죽끈으로 동여매 억지로 사용하듯, 여기저기 금이 간 상다리를 가죽끈으로 동여매 억지로 지탱하듯, 아난다, 내 몸도 그와 같구나.” 아난다가 눈물을 닦고 합장하였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계시지 않으면 저희는 누구를 믿고 무엇에 의지해야 합니까?”
월간불광 과월호는 로그인 후 전체(2021년 이후 특집기사 제외)열람 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불광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