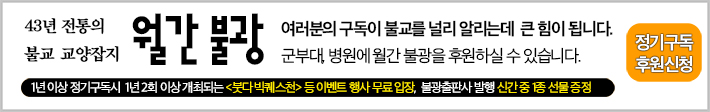[사찰벽화이야기] 장육사 극락전 문수보살도·보현보살도
내가 누구인지 묻지 마세요
불현듯 장육사莊陸寺 관음전의 주련柱聯 이 내게 말을 걸어온다.
‘백의관음은 말없이 말하고, 선재 동자는 듣지 않고도 듣는구나(白衣觀音無說說 南巡童子不聞聞).’
논리의 그물코를 찢어버린 초월의 언어일까, 순례자의 근기를 시험하려고 쳐놓은 함정일까? 어쩌면 그것은 데리다 (Jacques Derrida) 가 말한 ‘존재 하면서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 것’과 비슷한 의미는 아닐까? 나는 관음과 선재가 나눈 문답의 배경을 떠올린다. 『화엄경』 「입법계품」이다. 선재가 만나는 선지식 가운데 28번째가 관음보살이다. 선재가 관음에게 묻는다.
“거룩하신 이여, 저는 이미 ‘위없이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 (無上正等覺) 의 마음’을 내었지만, 보살 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의 도를 닦아나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거룩하신 이께서잘 가르쳐 주신다 들었으니 제게 말씀해주소서.”
관음보살의 대답은 다소 장황하지만, 한 마디로 줄이면 대비 大悲 다. 중생을 지극히 가엽게 여기는 마음으로 행할 뿐. 『화엄경』의 관세음보살은 분명 말로써 선재의 질문에 답했다. 이처럼 번듯한 관음과 선재의 문답을 침묵 속 비전 祕傳 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선가 禪家 특유의 솜씨다. 불법 佛法 의 기틀을 이을만한 이에게 이 구절은 심오한 화두겠지만, 그릇이 질박한 나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백의관음의 설법이 사찰 벽화와 다르지 않다는 생각’ 말이다. 문수와 보현의 그림을 보러 영덕까지 내려와서 벽화가 그려진 대웅전이 아니라 관음전 앞에서 서성이고 있는 것이 생뚱맞아 보이겠지만, 어쨌든 나는 주련을 읽으며 벽화를 생각하고 있었다.
대웅전에 다시 들어가 그림을 본다. 불상을 마주 보고 섰을 때 오른편 벽에 그려진 그림이 문수이고, 왼편이 보현이다. 문수와 보현은 모두 쌍상투를 튼 동자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얼굴은 아이답지 않게 근엄하고 엄숙하다. 문수는 승려들이 독경하거나 설법할 때 지니는 여의如意 를 들었고 보현은 만개하려는 연꽃을 손에 쥐고 있다. 문수는 사자 위에 유희좌 자세로 앉아있고, 보현은 코끼리 위에서 노닌다. 문수의 사자가 웅크린 자세의 정적인 모습이라면, 보현의 코끼리는 코를 하늘로 뻗은 채 어디론가 달려가는 것 같다. 화사는 문수의 지혜와 보현의 실천이 지니는 이미지를 사자와 코끼리의 자세를 통해 전달하려는 것일까. 나는 고개를 흔든다. 문수와 보현을 그린 수많은 사찰벽화 가운데서도 빼어난 작품으로 손꼽히는 이 그림이 정확히 언제 그려졌는지 아무도 모른다. 다만 후불벽의 영산회상도와 왼편의 지장도가 1764년에 조성되었으니 그때쯤이 아닐까 추정할 뿐이다.
각각의 그림에는 화제畫題 가 있는데, 문수도 에는 ‘문수는 깨달음에 통달했다(文殊達天眞) ’란 글이 보이고, 보현도에는 ‘보현이 연기를 밝혔다(普 賢明緣起) ’라고 쓰여 있다. 문수야 그렇다 치고 ‘보현이 연기를 밝혔다’는 말은 이해하기 어렵다. 한문으로 된 불교의 말들은 예나 지금이나 어렵고 애매한 것 투성이다. 그래서 나름 진지한 자세로 공부를 하는 이들은 한문 불전을 버리고 산스크 리트나 팔리어 원전을 읽어야만 ‘진짜 불교’, ‘붓다의 원음原音 ’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나는 이런 주장을 펼치는 이들의 선의는 십분 이해 하지만, 그 주장에 담긴 순진함과 맹목성에는 힘을 보태기 어렵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늘 선의로 포장되어 있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보자. 붓다는 녹야원에서 다섯 비구를 만나 자신이 ‘amṛta’를 얻었다고 말했다. 우리는 사전을 뒤져 ‘amṛta’를 찾고 ‘감로’와 ‘불멸’ 의 뜻이 있음을 확인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는 우선 붓다가 말한 ‘감로’가 신들이 만찬에서 마시는 음료인 넥타르인지, ‘불멸’의 비유인지 판단해야 한다. 한문 경전에서는 이를 ‘불사不死 ’ 라 번역했다. 만약 ‘불사’나 ‘불멸’을 선택했다고 해도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 그것이 영원히 사는 금강불괴의 육신을 얻었다는 뜻인지, 불멸의 영혼을 획득했다는 뜻인지, 윤회를 벗어나 다시는 죽지 않는다는 뜻인지 해석해야 하는 문제는 남는다. 설령 ‘불사’가 ‘해탈’이라고 의미를 확정하 더라도 해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것이 내삶과 현실 속에서 어떻게 연관을 맺는지에 대해선 또 해석과 실천이 나누어지게 마련이고, 그 다양성이 보장될 때 불교는 생명을 얻는다. ‘불사’ 나 ‘해탈’이란 단어 속에 붓다의 ‘본래 의도’나 ‘본 질적 고갱이’가 있을 것이란 달콤한 허상에 붙들린 이가 있다면, 불교의 핵심사상인 ‘연기緣起 ’조차 십이연기, 공, 아뢰야식, 여래장, 법계연기 등으로 ‘끊임없이’, ‘연기적’으로 변해왔다는 반증을 드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나는 붓다의 ‘원음’을 통해 그 가르침의 실체를 찾으려 하고, 성지를 순례하면서 역사적 붓다의 때 묻지 않은 본 모습을 확인하려 드는, 불교 인들의 순결하고 성스러운 ‘본질을 향한 열망’이 야말로 가장 반불교적인 행태라 여긴다(그렇다. 불교의 가장 큰 적은 기독교가 아닌 붓다의 자식임을 자처하는 불교인들이 다.) . 만약 붓다가 철학자 푸코(Michel Foucault) 의 말-“내가 누구인지 묻지 마시오. 나에게 거기에 그렇게 머물러 있으라고 요구하지 말란 말입니다.”-을 들었다면 공감의 물개박수를 쳤을 것이 분명 하다. 막 흥이 올랐는데 내 안의 누군가가 분위기를 깬다. 네, 잘 들었고요. 그래서 ‘보현이 연기를 밝혔다’는 뜻이 대체 뭐요?
장육사 대웅전 벽화에 쓰인 ‘문수달천진’과 ‘보현명연기’는 서산 대사의 『선가귀감』에 나오는 말로 유명하다. 말이라는 것은 사전에 나온 단어의 뜻보다 문맥에서 쓰이는 실제적 의미가 더중요한 법이니 『선가귀감』의 구절을 살펴보자.
“이치는 단박에 깨칠 수 있으나, 습성과 업은 단번에 제거할 수 없다(理雖頓悟 事非頓除). 문수는 깨달음을 마쳤고, 보현은 연기를 밝혔다(文殊達天眞 普 賢明緣起). 이해는 번갯불 같으나, 수행은 『법화경』 에 나오는 거지의 비유처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解似電光 行同窮子).”
서산은 『능엄경』의 구절(理則頓悟 事非頓除) 을 빌려와서 이에 대한 해석으로 문수와 보현을 등장시 킨다. 서산은 문수보살을 단박에 깨닫는 이치에 비유하고, 보현보살은 점차로 닦아나감의 상징으로 채택했다. 소위 돈오점수다. 그러나 서산의 해석도 어디까지나 일편의 해석일 뿐이다. 실은 『원 각경』의 「문수보살장」과 「보현보살장」을 전통적 으로 요약해 온 말이 ‘문수달천진 보현명연기’이 다. 그런데 서산은 『원각경』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뜻으로 이 구절을 사용했다. 『원각경』 「보현보 살장」의 핵심은 다음의 구절이기 때문이다. “환상을 떠나면 곧 깨친 것이라, 점차로 닦아 나갈 것도 없다(離幻卽覺 亦無漸次).” 이는 돈오돈수다.
그렇다면 벽화에 등장하는 문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화사는 『선가귀감』에서 쓰인 의미로 벽화에 글을 넣었는가, 아니면 『원각경』의 키워드를 글자에 담았는가? 어쩌면 그런 건 그리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더 긴요한 문제는 벽화를 ‘우리 시대와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실하게 읽어낼 수 있는가’로 귀결된다. 다시 말해 ‘문수 달천진 보현명연기’란 말을 텅 비어있는 그릇으로 바라볼 때만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뜻과 실천으로 채워갈 수 있는 것이다. ‘문수-지혜’, ‘보현-행원行願 ’ 혹은 ‘문수-돈오’, ‘보현-점수’와 같은 도식 속에서 기계적으로 벽화를 바라보는 이들에겐 벽화는 아무런 말도, 감흥도 전해주지 않는다. 내가 관음전 앞을 서성이며 기존의 알음알 이를 버리려 애썼던 이유도 그래서였다. 우리는 문수와 보현을, 또 불교를 단 하나의 본질을 지닌 고정된 실체로 묶어둘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로 읽어내야 한다. 『화엄경』 「입법계품」만 보아도 문수가 발심과 믿음을 상징하고, 보현은 수행의 완성과 깨달음을 의미한다. 또 문수와 보현의 관계를 통해 깨달음은 비록 개별적(特殊) 이나 그실천은 사회적(普遍) 이어야 한다는 해석도 가능하 다. 내게 문수와 보현은 불교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사찰벽화를 어떻게 읽을 것인지 자꾸만 물어오는 까다로운 선지식이다.
내가 관음전 주련의 글귀에서 읽어낸 것은 엉뚱하게도 사찰벽화의 의미였다. 관음의 ‘무설 無 說 의 설법’이 사찰벽화와 같은 이유는 그림이야말로 말 (음성) 없이 말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림은 오로지 들으려 애쓰는 자에게만 들리는 침묵 속의 말이다. 그림뿐만 아니라 글로 쓰인 것도 그렇다. 텍스트 (경전) 는 내가 굳이 책장을 펼치고 자신의 목소리로 읽어내는 수고가 없으면 그 말을 들을 수 없다. 자신의 목소리로 읽는다는 것은 텍스트의 지평과 내 현실의 지평이 서로 연기적으로 융합한다는 뜻이다. 읽기가 궁극에 달하면 자잘한 지식이나 교양을 보태는 데 만족하지 않고 삶을 근원적으로 바꾸려 든다. 궁극의 읽기란 저텍스트가, 이 그림이 내 속으로 훅 들어와 내 존재를 흔드는 사무침의 읽기다. 다시 말해 자타불 이의 읽기, 부처와 보살로서의 읽기다. 그러려면 텍스트도 열려 (空) 있고, 나도 열려 (空) 있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선재 동자가 ‘듣지도 않고 들은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제 당신의 목소리가 듣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