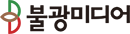잘 알려지지 않은 영남의 명산, 비슬산. 이 비슬산 자락의 고을에 얽힌 이야기가 여럿 있다. 예로부터 영남의 현풍과 유가 고을 사람들은 서당과 서원, 향교에서 『소학(小學)』으로 인성을 길렀다. 그래서인지 조선시대 중엽까지 풍미했던 “조선 인재의 반은 영남에 있다”는 말은 1751년 이중환이 『택리지』에 기록할 정도였다. 그 유명세를 따라 이곳에도 서원과 향교가 남아 있다. 유학 동네의 서원과 향교, 그 속에 공존하고 있는 절의 모습도 우리가 새롭게 볼 측면들이다. 유교 사관에 젖은 당시 사람들과는 달리 기층 민중들과 삶을 함께했던 수행자들의 이면을 엿볼 수 있는 지점이라 고증의 가치도 있다.
1392년 조선 개국으로 ‘학문의 전당’ 지형이 바뀌었다. 불교는 유학인 성리학으로, 절은 서원과 수호(守護)사찰로 대체됐다. 나라의 안녕과 고을의 길복(吉福)을 위해 국가에서 1407년부터 지정한 자복(資福)사찰은 그 하나의 증거다.
16세기부터 절들은 수호사찰로도 변모했다. 왕조실록을 보관한 사고 수호나 왕실의 태실 안위와 보호 또는 전란의 공을 세운 이를 위한 사당으로 바뀌었다. 시묘살이를 위한 암자를 겸한 수호사(守護舍)도 있다. 또 서원의 수호사찰로 왕릉과 왕실 묘를 지키는 능침 혹은 봉릉사찰과 마찬가지로, 조선 후기 사찰은 서원·향교를 보좌하는 역할과 임무를 맡았다. 이 과정에서 ‘빈대 설화’도 생겨났다. “유독 절에 빈대가 들끓어서 승려가 절을 불태우고 떠났다”는 빈대사찰의 구전설화는 유자(儒子)로 지칭되는 빈대들의 산천 유람에 가마꾼과 시중, 엄청난 조세와 부역을 견디다 못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내버린 폐사지에 관한 이야기다. 이 시기에 전국적으로 생겨난 텅 빈 절을 말한다.
도동서원
오늘날 비슬산 자락의 달성군에는 유교 유산이 곳곳에 있다. 조선시대 향교는 ‘일읍일교(一邑一校)’ 원칙으로 현풍향교가 있다. 서원은 11개소, 서당은 남계서당(유가읍)·승호서당(논공읍)·금암서당(다사읍)이 현존한다. 정사(精舍)인 수봉정사(화원읍) 1곳과 육신사, 포산사 등 사당(祠堂) 2곳도 남아 있다.
2019년 7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대구 달성 도동서원은 ‘소학의 화신’으로 불린 김굉필을 배향하는 사액(임금이 내린 편액)서원으로, 서원 철폐령에도 제외된 곳이다. 전학후묘(前學後廟)·전저후고(前低後高)의 건물배치는 중국 송나라 주희가 말한 ‘추뉴(樞紐, 만물의 축과 중심을 나타냄)’를 이뤘다.
월간불광 특집 기사 전문은
유료회원에게만 제공됩니다.
회원가입후 구독신청을 해주세요.
불광미디어 로그인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