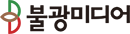탕춘대성(蕩春臺城)을 통해 한양도성과 연결된다. 사진 유동영
조선은 성리학 이념을 추구하는 국가로 개국 이래 숭유억불 정책을 추진했다. 그렇지만 불교를 아예 부정할 수는 없었으며, 승려가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내고 도첩(度牒)을 받으면 국역을 면제해줬다.
조선이 승려에 주목한 계기는 임진왜란 중 자발적으로 봉기한 승군들이 혁혁한 전과를 올리며 분위기를 반전시켰기 때문이다. 특히 1594년(선조 27)에는 가야산의 용기산성(龍起山城), 지리산의 귀성산성(龜城山城), 합천의 이숭산성(李崇山城) 등에 대한 축성과 보수를 위해 대규모의 승군을 투입했는데, 이때 산성 내부에 승영사찰(僧營寺刹)을 새롭게 건립하고 승군을 주둔시켜 장기 전투에 대비했다. 조정이 승군에게 산성의 축성과 수비를 맡긴 실질적인 이유가 있다. 전쟁이 소강상태로 접어들면서 장기화되자, 총섭의 통솔 아래에서 엄격한 기율(紀律, 행위의 표준이 될 만한 질서)로 움직이는 승군을 활용해 짧은 기간 안에 산성에 대한 축성 및 보수를 완료하고 더불어 장기적으로 산성을 방어하기 위해서였다. 즉, ‘도총섭 → 총섭→ 승장 → 승병’으로 이어지는 승군의 지휘체계를 이용해 승군 조발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승군의 노동력을 국가가 적절히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처럼 산성의 축성과 수비를 위해 승군을 동원하고 사찰을 건축해 승영(僧營)에 주둔시키는 승군제도는 임진왜란 이후에도 일관되게 추진됐으며, 그 대표적인 축성과 운영 사례가 남한산성과 북한산성이다.
남한산성과 승군
남한산성의 수축에는 승병이 큰 역할을 했다. 남한산성은 1624년(인조 2) 본격적으로 축성한 산성이다. 수어사(守禦使) 이서(李曙, 1580~1637)가 산성 축성에 대한 감역(監役, 공사 감독)을 맡게 되자 그는 인조에게 상소해 전라남도 구례 화엄사 출신의 벽암각성을 제1대 팔도도총섭(八道都摠攝)●에 임명했다.
● 도총섭(都摠攝)은 나라에서 내렸던 승려에 대한 직책 중 최고의 승직(僧職)이다.
도총섭인 벽암각성(碧巖覺性, 1575~1660)은 각도의 승군을 소집한 뒤 서북성을 담당해 축성했다. 또한 산성의 수어(守禦, 방어)를 위해 성내에 9개의 사찰을 두어 팔도에서 올라온 승군이 숙식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원래 남한산성에는 망월사(望月寺)와 옥정사(玉井寺) 2개의 사찰만 있었는데, 산성의 수축과 함께 개원사(開元寺), 국청사(國淸寺), 남단사(南壇寺), 장경사(長慶寺), 천주사(天主寺), 한흥사(漢興寺) 등 6개의 사찰을 새로 지었다. 이후 동림사(東林寺)와 영원사(靈源寺)도 지어졌다.
남한산성 승영사찰의 운영은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등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사찰 이름과 위치, 사찰의 수리와 구성, 승군의 수와 무기의 수 등에 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인조 갑자년(1624년)에 성을 쌓을 때 각성 스님을 팔도도총섭으로 삼아 성을 쌓는 역을 맡겨 8도의 승군을 불러 모집하고, 성안의 각 사찰에 명을 내려 8도 부역 승군의 공궤(供饋, 음식을 줌)를 분장했다. 이로써 각 사찰이 비로소 각 도 의승의 입번(立番, 군대에 복무)을 주관했으며, 승총·절제·중군·주장의 명칭이 생겼다.
월간불광 특집 기사 전문은
유료회원에게만 제공됩니다.
회원가입후 구독신청을 해주세요.
불광미디어 로그인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