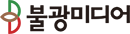백제는 다른 나라에 불교를 전해준 나라로 흔히 기억되고 있다. 아무래도 신라와 일본에 탑을 세우고 불상을 보내 준 사실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중국 유학을 다녀오기도 험난했던 6세기 중반 시절에, 겸익(謙益)이라는 스님을 보내 인도 불교를 직접 들여오기도 했다. 겸익 스님의 이야기는 ‘미륵불광사’라는 옛 절에서 전해졌다고 하므로, 백제 불교와 미륵신앙의 인연이 새삼 확인되고 있다. 또 지금 살펴볼 이야기들 역시 여러모로 ‘미륵’과 얽힌 것들이 많아서, 백제 불교의 핵심은 곧 미륵신앙에 있다고 할 만하다. 우리는 미륵을 미래불이라고도 한다. 태봉의 궁예 이래로 많은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이 자신을 미륵에 빗대거나, 힘겨운 민중이 미륵의 세상을 고대하기도 했다. 따라서 미륵이 한국인의 정신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만만하지 않다.
그런데 ‘창세가’ 같은 서사무가를 보면, 미륵은 미래가 아닌 과거와도 연결된다. 인간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한 신은 미륵이었는데, 석가와의 내기에서 속임수 탓에 승리를 도둑맞고 일단 물러났다는 것이다. 두 신이 서로 인간 세상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는 이야기는 전 세계에 많이 있지만, 하필 신의 이름이 석가와 미륵이 된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아마 석가모니 부처님의 세상인 우리 현실에 왜 이렇게 악인과 악행들이 많은지 이유를 애써 찾느라 무리해서 석가를 악당으로 묘사했나 싶지만, 필자는 이 이야기에서 사라진 미륵이 곧 자취를 찾기 어렵게 된 백제 불교와 문화를 상징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곤 한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신라 불교가 이후 한국불교의 튼실한 뼈대가 된 점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백제 불교는 마치 사라진 미륵처럼 무의식적인 그리움의 대상이기도 하다.
사진. 유동영
미시랑과 신라에 전해진 미륵
신라의 삼국통일에서 화랑의 역할은 결정적이었다고 한다. 특히 세속오계의 임전무퇴 정신이 주목받아, 육군사관학교를 화랑대라 부르고 군가에도 ‘화랑의 핏줄’ 운운한다. 그런데 화랑은 원래 ‘원화(源花)’라는 이름으로, 젊은이들이 아름다운 여인을 따르던 단체였다. 그러다가 여인들끼리 서로 시기하여 살인사건이 일어나자, 여자 대신 남자를 우두머리로 삼는 화랑 제도로 개편했다는 것이다. 『삼국사기』에는 원화가 해체되고 화랑으로 대체되는 과정은 생략했는데, 『삼국유사』는 화랑이 다시 창단되고 미륵의 이미지를 얻기까지 백제 불교가 끼친 영향력을 암시하고 있다.
월간불광 특집 기사 전문은
유료회원에게만 제공됩니다.
회원가입후 구독신청을 해주세요.
불광미디어 로그인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