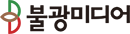목숨 걸고 인도서 법을 구하다
4세기경 우리나라에 수용된 불교는 곧 국교로 자리 잡았고, 삼국은 자국의 불교문화를 발전시키고자 많은 스님을 해외로 보내 선진적인 불교 문물을 들여왔다. 당시 불교의 선진 지역인 인도와 중국에서 활동한 스님들을 구법승(求法僧)이라고 한다. 백제는 6세기 무렵부터 자국의 스님들을 파견했고, 기록상 삼국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구법 활동을 떠난 스님은 고구려의 승랑이다. 승랑은 476년 중국으로 건너가 양 무제에게 발탁되어 당시 고승들에게 삼론학을 가르쳤고, 중국에서 활동하다 입적했다.
삼국은 중국뿐만 아니라 불교의 본류라 할 수 있는 인도에도 많은 스님을 파견했는데, 인도에서 구법 활동을 한 스님들을 입축구법승(入竺求法僧)이라고 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왕오천축국전』을 저술한 신라의 혜초도 입축구법승이다. 국내외 기록에 남아 있는 우리나라 입축구법승은 14명이고, 그중 신라 출신이 12명이다. 입축구법승 대부분은 7, 8세기에 인도로 법을 구하러 떠났다. 당시 목숨을 걸고 인도로 떠났던 구법승들은 험난한 여정과 현지의 선진적인 불교를 향한 열의로 자의든 타의든 귀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서 언급한 인도로 간 14명의 스님 중 무사히 국내로 귀국한 인물은 3명에 불과했다.
이는 곧 인도 현지에서 구법 활동을 하는 게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일 뿐만 아니라, 구법 활동을 마치고 무사히 귀국하는 일도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중 구법 초창기인 6세기 초 삼국 스님 중 인도에 가서 법을 구하고, 본국으로 귀국한 인물이 백제 입축구법승 겸익이다. 기록에 따르면 겸익은 율을 구하기로 마음먹고 바다를 건너 인도로 떠났다. 중인도에 도착한 이후에는 이 지역의 상가나대율사라는 곳에 머물면서 수년간 인도의 말과 글을 익히고, 계율을 연구했으며, 더불어 계체를 닦으며 수행을 계속했다.
이후 인도에서 율을 구하고자 한 구법 목적을 달성한 겸익은 526년(성왕 4) 계율에 관한 가르침을 기록한 율장과 그 해설서라고 할 수 있는 논장을 가지고 인도 스님 배달다삼장과 함께 귀국했다. 귀국 후 겸익은 성왕의 적극적인 후원 아래 흥륜사에 주석하면서 국내 고승들과 함께 역경 사업을 진행했으며, 귀국 시 가지고 온 범본 율서들을 72권으로 번역했고, 성왕은 이 책의 서문을 짓고 태요전에 보관했다.
위와 같은 겸익의 활동에 관한 내용은 1918년 이능화가 저술한 『조선불교통사』의 「미륵불광사사적」에서 처음으로 소개됐다. 이후 1920년대 들어서 『저역총보』(금명보정, 1920)와 『부여지』(1929, 부여군청)의 「대조사미륵실기」에도 겸익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능화는 『조선불교통사』 저술 이외에도 무능거사라는 필명으로 잡지 「불교」 7호(1925)에 겸익에 관한 글을 게재했고, 31호(1927)에서도 겸익의 구법 활동을 언급했다.
월간불광 특집 기사 전문은
유료회원에게만 제공됩니다.
회원가입후 구독신청을 해주세요.
불광미디어 로그인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